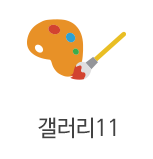문화포커스
- [남효선_동해연안의 문화여행]울진사람들 끼니마다 밥맛 돋우는 꽁치 간수
- 컬처라인(cultureline@naver.com)
![]()
동해연안의 생활문화
울진사람들 끼니마다 밥맛 돋우는 꽁치 간수
“고추장은 없어도 꽁치 간수 한 종지면 밥 한 그릇 뚝딱”
글. 남효선
울진사람들이 사철 밥상에 올리거나 늘 집 장독대 곁에 갈무리해 놓고 즐겨 먹는 요긴한 먹거리 중 하나가 젓갈이다. 울진사람들은 젓갈을 ‘간수’라고 부른다.
젓갈을 간수라고 부르는 까닭은 젓갈에 포함된 물이 ‘간이 밴 물’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간수를 달리 ‘젓국’이라고 부르는 것도 이런 이유와 무관치 않다.

울진사람들에게 간수는 장류의 대표 격인 된장이나 간장, 고추장처럼 매우 요긴한 밑반찬이나 양념으로 인식된다. 특히 울진 해촌(海村)의 대부분 가정에서는 사철 끼니마다 밥상에 간수를 올리며, 특히 해초나 산나물 따위의 나물 무침이나 아낙들의 한 해 살림살이의 마지막 일이라 할 수 있는 김장에는 반드시 간수를 사용한다.

울진지방에서는 간수를 대개 꽁치나 멸치, 메가리(전갱이)로 주로 담갔다. 이들 꽁치나 멸치, 메가리는 죽변항을 비롯 후포항 등 울진지방의 크고 작은 항포구에서 연중 잡히는 어족이다. 이 중에서도 울진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간수 재료는 꽁치이다. 꽁치는 ‘아카시꽃 필 무렵 몰려들었다가 아카시꽃이 질 무렵이면 사라지는 고기’로 봄철에 파시를 이루는 생선이다. 이때를 놓치면 멸치나 메가리가 나오는 가을철까지 기다려야 하므로 아낙들은 꽁치철이면 반드시 간수를 담을 꽁치를 구입했다. 울진사람들은 이를 두고 “꽁치간수는 보리누름에 담근다”고 한다.
◇ ’보리 팰 무렵’ 잡히는 ‘보리꽁치’가 최고....울진지방 별미 ‘꽁치국수’
때문에 울진사람들은 사철 잡히는 꽁치 중 ‘보리 팰 무렵’ 잡히는 꽁치를 ‘보리꽁치’라고 부르며 가장 맛이 좋은 상품으로 여겼다. 이 무렵 사람들은 죽변항과 후포항을 비롯 울진지방의 크고 작은 포구에 밀려들 듯 떼를 지어 북상하는 보리꽁치를 잡아 요긴한 먹거리로 활용했다.
이 먹거리 중 울진지방 전통음식의 별미로 자리 잡은 것이 ‘꽁치국수’이다.
평생 죽변항에서 잡히는 싱싱한 해산물로 가족들의 먹거리를 장만해 온 심월옥(83, 울진읍 양정리) 할머니가 전하는 꽁치국수 조리법이다.
|
싱싱한 꽁치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총총 썬 뒤 칼등으로 꽁치 머리부터 자근자근 두드리며 으깨어 다진다. 이때 꽁치 내장도 함께 다진다. 버리는 것은 맨 마지막 꽁치 꼬리 부위뿐이다.
식구 수를 가늠해 예닐곱 마리의 꽁치를 내장 채로 썰어 다진 후 여기에 마늘잎을 뭉텅뭉텅 썰어, 다진 꽁치고기에 넣고 재차 골고루 섞어 다진다. 마늘잎을 섞어 다지는 까닭은 꽁치의 비릿한 냄새를 잡아주고 또 양념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마늘잎은 보리꽁치가 쏟아지는 무렵에 함께 나는 제철 먹을거리이다. 이렇게 마늘잎을 섞어 다진 후, 밀가루를 약간씩 뿌려 다져진 꽁치 살점을 몽글몽글하게 반죽한다.
잘 다진 꽁치와 마늘잎으로 만들어낸 반죽을 *푸레이를 끓이듯 칼끝으로 조금씩 떼 내어 끓는 물에 넣는다. 끓는 물에 던져진 꽁치 살점은 흡사 동그랑땡이나 만두 교자처럼 동그랗게 끓는 물 위에 뜬 채로 노릿하게 익는다. 한소끔 끓인 다음 집 간장으로 간을 맞춘다. 이렇게 집 간장으로 간을 맞춰 끓이면 국수를 삶기 위한 육수를 따로 장만하지 않아도 된다.
국수는 미리 삶아 건져 놓는다. 국수를 한 무더기씩 그릇에 담은 후, 여기에 다진 꽁치 완자를 끓여 우려낸 육수와 꽁치 완자를 국자로 퍼 담으면 꽁치국수가 완성된다.
*푸레이 : 옹심이를 일컫는 울진지방 방언 |
사철 밥상에 오르는 간수 장만을 위해 울진지방 아낙들은 꽁치 떼가 몰려오는 보리 팰 무렵에 꽁치를 구입해 간수를 담근다. 꽁치 간수를 제때에 장만해 놓아야 그해 겨울 김장을 담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간수 용으로 쓰이는 꽁치는 주로 그물에 걸려 살점이 찢어졌거나 성치 않은 꽁치를 사용한다. 꽁치나 메가리를 구하지 못한 가정에서는 오징어 내장으로 간수를 담그기도 했다.

간수 담그는 일은 만만치 않다. 더구나 삭히는 음식이므로 보관과 관리 또한 각별하게 해야 한다. 간수를 잘못 담그면 벌레가 생기거나 서리처럼 허옇게 변하기 때문이다. 간수 담그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간을 잘 맞추는 일이다.
그 다음은 담가 놓은 간수 단지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하는 일이다.
울진사람들은 꽁치 간수를 담글 때 대개 ‘꽁치 3~4두름(60마리 가량)에 소금 반 되’ 정도가 가장 간이 잘 맞는 비율로 여긴다. 옹기 단지에 꽁치를 한 켜 깔고 소금을 웃 뿌린 뒤 다시 그 위에 꽁치를 한 켜씩 올리는 방식으로 담근다. 그런 다음 옹기 단지의 주둥이를 단단히 매고 그 위에 재를 덮어서 그늘에 두고 삭힌다. 이때 간수를 담은 옹기 주둥이는 반드시 삼베 조각으로 단단히 여민다. 이렇게 해야 바람이 잘 통하기 때문이다.
또 간수가 완전히 삭을 때까지 가끔씩 호박잎과 볏짚을 넣어 간수가 우러나오면서 생기는 생선의 기름기를 제거해 주었다. 간수가 적당히 삭아 발효되면 켜켜이 쌓아놓은 꽁치의 형체가 허물어지고 그 위에 말간 물이 우러나온다. 김장에는 이렇게 삭은 간수를 체로 걸러 맑은 간수 물을 받아 양념으로 사용했다. 평소에는 간수 건더기를 꺼내 마늘과 고춧가루로 버무려 밥상에 올렸다. 울진 해촌 사람들은 꽁치 간수 건더기를 쪽쪽 찢어 밥 위에 얹어 먹는 것을 최고 일미로 쳤다.

간수는 장기간 보관이 가능하므로 꽁치철인 봄에 담궈 그 해 가을부터 밥상에 올려 다음 해 가을까지 밑반찬으로 요긴하게 사용했다. 꽁치와 메가리로 간수를 담글 때는 꼬리와 지느러미, 내장을 제거한 후 삭혔으며 멸치 간수는 통째로 사용했다.
창으로 들어오는 보드라운 햇살에 손을 쬐고 싶은 겨울이다. 집집마다 항아리 뚜껑을 여느라 분주하다. 긴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 혹은 다음 한해를 주리지 않고 살기 위해 김장을 담고, 된장과 고추장 그리고 간장 같은 집안의 맛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봄을 품고 있는 꽁치간수도 그 중에 하나이다. 시간을 모으고 세월을 쌓아올려 잘 삭은 것들은 우리를 위로한다. 내게도 잘 삭았으나 남에게 이로운 것, 누군가를 배불릴 수 있는 것, 먹을 때만큼은 시름을 잊게 하는 것, 생각만으로도 든든한 것이 있을까? 꽁치간수로 버무린 찬들과 소주를 앞에 두고 얼마 남지 않은 올해에 대한 반성문을 쓰고 있다. 다짐은 얼마 못가 부서지고 말겠지만, 그래도 희망을 껴안기 위한 첫 마음은 오래된 맛들과 함께 시작되었다.

- 글쓴이 : 남효선
- 경북 울진에서 태어났다. 동국대학교 국문학과를 졸업했으며, 안동대학교 대학원에서 민속학을 공부하였다. 1989년 문학사상의 시 부문에서 신인상 수상으로 등단하였다. 한국작가회의, 경북작가회의, 안동참꽃문학회 등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시집으로 『둘게삼』이 있다. 현재 시민사회신문의 전국본부장으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