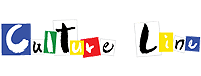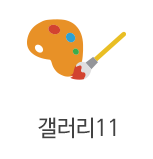문화포커스
- [안경애_영주 문화산책, 지역의 역사인물]무섬, 매화 떨어진 자리
- 컬처라인(cultureline@naver.com)

이야기가 있는 문화탐방
무섬, 매화 떨어진 자리
글. 안경애
사진. 김연교
무섬에 와서 보니 알겠네
메마른 눈짓이었을 뿐이었었노라
떠나보낸 시간들은 여기 켜켜이 모래로 쌓이고
물길이 되어 흐르고 있었다는 것을
둘 데도 놓을 데도 없이 정처 없는 마음자리일 때
하도 외로운 발길이 하염없이 물가로 향할 때
여기 그리움이 먼저 와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무섬에 와서 보니 알겠네
<최대봉, 『무섬에 와서 보니』 中>

고풍스러운 와가(瓦家)와 초가(草家) 40여 채가 어깨를 맞대고 옹기종기 모여 있는 무섬은 물 위에 떠 있는 섬을 말하는 ‘수도리(水島里)’의 순 우리말 이름이다. 낙동강의 지류인 내성천이 서천의 물과 만나 마을을 감싸듯 돌아 흐르고 있어 마치 섬과 같은 느낌을 준다고 해서 무섬마을이다. 마을 앞 외나무다리가 놓인 강변을 바라보고 있으면 어릴 때 부르던 노래가 절로 떠오른다.
엄마야~누나야 강변 살자. 뜰에는 반짝이는 금모래 빛~
무섬은 조선중기 1666년[헌종7] 반남박씨 입향조 박수(朴燧, 1641~1729)가 강 건너 마을 머럼에서 이곳으로 건너와 숲을 정리하고 집(만죽재)을 짓고 살면서부터 마을이 형성되었다. 그 후 박수의 증손서(曾孫壻) 김대(金臺, 1732~1809)가 1757년[영조33]에 처가 마을인 이곳 무섬으로 들어와 살면서 반남박씨와 선성김씨(예안김씨) 두 집안의 집성촌이 되었다.

물위에 떠있는 섬, 무섬은 풍수지리상 ‘물위에 핀 연꽃(蓮花浮水)’ 또는 ‘매화 떨어진 자리(梅花落地形)’로 풀이되는 길지로 명성과 덕망 높은 자손이 많이 나온다는 곳이다. 조선시대 병조참판 박제연, 의금부도사 김락풍, 승문원 정자 김휘병 등이 있으며 현재 선조들의 선비정신을 이어받아 무섬 40여 가옥에서 박사, 대학교수가 19명이다. 이들은 ‘무섬 교수회’라는 모임을 갖고 있다.
무섬에는 ‘가마타고 들어와 상여타고 나간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듯 주변과 고립되어 있다. 가마타고 시집오는 길도 외나무다리고 죽어서 상여타고 나가는 길 또한 외나무다리다. 1986년 마을이름을 딴 콘크리트 다리 수도교(水島橋)가 놓이기까지 350년을 무섬과 바깥세상을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는 외나무다리였다. 무섬 외나무다리는 비가 많이 오면 강물에 잠겼고 홍수가 지면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갔다.
그럴 때 마다 마을 사람들은 합심해 외나무다리를 새로 놓았다. 몇 년 전에도 폭우로 다리가 떠내려가 외나무다리 축제가 취소되기도 했다. 사진작가들에 의해 알려지기 시작한 무섬 외나무다리는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도 선정됐다. 유명여배우가 무섬 외나무다리에서 찍은 CF가 방송되면서 전국에 알려졌다. 어느새 삶의 애환서린 외나무다리는 삶을 위로하는 축제가 되었다.
무섬마을에는 마을 터가 크지 않아 집 앞 텃밭은 있지만 농사지을 이렇다 할 논밭이 없다. 우물과 조상을 모시는 사당도 없다. 그러나 외나무다리 건너, 바깥 마을 곳곳의 토지를 소유한 부유한 마을이었다. 무섬마을 지형은 행주형(行舟形)으로 배에 구멍이 있으면 가라앉는다고 하여 우물을 파지 않고 대신 강가에 구덩이를 파고 불순물을 가라앉혀 깨끗한 물을 얻었다고 한다. 또 삼면이 강물인 무섬은 홍수가 잦아 따로 사당을 짓지 않고 대신 위패를 모시는 감실을 두었다.

무섬에는 일제강점기인 1928년 김락풍의 증손자 김화진 등 마을 청년들이 세운 ‘아도서숙(아시아 반도의 서당)’이 있다. 아도서숙은 글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글을 가르치고(문명퇴치), 농업기술을 가르쳤으며(농촌부흥운동) 우리말로 민족교육을 실시하면서 민족의 얼을 드높였다(민족교육).
아도서숙의 무섬청년들은 신간회영주지회와 영주청년동맹을 이끌었으며 신간회영주지회와 청년동맹이 일제에 의해 궤멸되자 지하조직인 영주적색농조를 결성해 투쟁했다. 아도서숙은 영주지역 항일운동의 거점이 되었다. 일제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항일독립운동을 이어가던 1933년 7월 11일 새벽, 일제는 경찰 1개 소대로 마을을 에워싸고 독립운동을 하던 마을사람들을 연행해갔다.
무섬동네 애국청년 아도서숙 세워놓고
대낮에는 아래한글 가르치고 한밤에는
독립운동 준비하여 항일투쟁 고취한다
큰일났네 난리났어 일본순사 앞잡이들
총칼들고 한밤중에 찾아와서 밧줄고리
엮어갔네 무섬청년 마을사람 잡아갔네
무섬마을로 시집온 고(故) 박명서 어르신이 달력 뒷장에 남긴 가사(歌辭)가 그 때의 긴박했던 상황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 당시 항일운동을 했던 김화진, 김종진, 김계진, 김성규, 김명진 다섯 명에게 건국훈장 애족장 및 건국포장이 추서되었고, 서훈을 신청하지 않았지만 함께 독립운동에 참여하고 옥고를 치른 박찬상, 박찬하 같은 분도 있었다. 이로써 무섬마을은 전국 단일마을 중 가장 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마을이 되었다.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된 무섬마을에는 해우당고택과 만죽재고택, 오헌고택 등 규모가 크고 격식을 갖춘 ‘ㅁ’자형 가옥과 *까치구멍집, *겹집, 남부지방 민가 등 다양한 형태의 구조와 양식을 가진 가옥이 모여 있다.
-------------------------------------------------------------------------------------------------------------------
*까치구멍집 : 초가지붕 옆면에 연기가 빠지도록 구멍을 낸 모양이 까치둥지를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이 구멍이 있는 집,
*겹집 : 안방·사랑방·부엌·마루·봉당 등이 한 채에 딸려있고 앞뒤 두 줄로 배치되어 있는 집
해우당고택(海愚堂古宅)은 1879년[고종16] 김낙풍(金樂灃, 1825~1900)이 건립했다. 김낙풍의 자는 성발(聖潑), 호는 해우당(海遇堂) 또는 대은(大隱)이다. 흥선대원군의 정치적 조언가로 알려져 있는 김낙풍은 흥선대원군이 정권을 잡기 전부터 막역지우로 지냈다한다. 흥선대원군이 무섬에 머물다 떠날 즈음 쓴 글씨가 『해우당(海遇堂)』과 안채에 붙어 있는 『대은정(大隱亭)』 현판글씨다. 망와(望瓦)에 “광서 5년 기묘 유월일(光緖五年己卯六月日)”이라는 명문이 남아 있어, 해우당고택이 1879년에 건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만죽재(晩竹齎)는 반남박씨(潘南朴氏) 판관공파(判官公派)의 종가로 입향조 박수가 1666년[헌종7) 강 건너 마을 머럼에서 건너와 무섬에 터를 잡고 처음 지은 집이다. 무섬에서 가장 오래된 가옥이자 무섬마을의 가장 중심부에 위치해 있으며, 만죽재 기와에 “1666년 8월 19일 김종일이 만들다”라는 연대기가 새겨져 있다. 만죽재 현판은 서화협회 고문과 조선미술전람회 평의원을 지낸 석운 박기양의 글씨다. 박기양은 형조참판, 함경도 관찰사를 지냈으며 행서(行書)와 대나무그림에 뛰어난 문신이자 화가다.

열하일기로 잘 알려진 연암 박지원의 손자인 실학자 박규수의 글씨가 남아 있는 박제연고택(현 오헌고택)의 ‘나의 집'이라는 의미의 『오헌(吾軒)』은 박제연(朴齊淵, 1807~1890)의 호를 딴 당호 편액이다. 큰 글씨 사이에 적힌 작은 글씨는 도연명의 시를 인용해 “뭇 새들도 깃들 곳이 있어 좋겠지만 나도 내 오두막집을 사랑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편액은 대제학, 우의정을 지낸 박규수가 당시 병조참판을 지냈던 박제연과 친분이 각별하여 그를 칭송하며 써주었다고 한다.

무섬에도 식당이 있다. ‘밥에 여러 가지음식을 섞어서 익힌 것’을 뜻하는 ‘골동반’을 상호로 쓰는 ‘무섬 골동반’이다. 그런데 최근 ‘무섬식당’으로 상호를 바꿔 달았다. 이제 골동반은 안한다는 건가? 왠지 서운한 마음이 든다. 이 무섬식당은 독립운동가 김성규 선생의 집을 복원한 것이다. 영양 주실마을 조동탁이 이 집으로 장가를 들었다. 김성규의 딸, 김위남(예명 김난희)과 혼례를 올렸다. 조동탁은 박목월, 박두진과 함께 청록파에서 활동했던 시인 조지훈이다. 그러니 무섬식당은 조지훈 처가 터인 셈이다.

조지훈은 아내에게 ‘난희’라는 예명을 지어주었다. 그는 신혼 초 자주 처가인 무섬에 머물렀다 하는데, 혼자 서울로 떠날 때 지은 시가 있다. 헤어지는 슬픔을 표현한 시 ‘별리(別離)’다. 별리 시비(詩碑)가 무섬마을에 세워져 있는 까닭이다.
푸른 기와 이끼 낀 지붕 너머로
나즉히 흰구름은 피었다 지고
두리기둥 난간에 반만 숨은 색시의
초록 저고리 당홍치마 자락에
말 없는 슬픔이 쌓여 오느니
십리라 푸른 강물은 휘돌아가는데
밟고 간 자취는 바람이 밀어 가고
방울 소리만 아련히
끊질 듯 끊질 듯 고운 뫼아리
발 돋우고 눈 들어 아득한 연봉(連峰)을 바라보나
이미 어진 선비의 그림자는 없어
자주 고름에 소리 없이 맺히는 이슬방울
이제 임이 가시고 가을이 오면
원앙침(鴛鴦枕) 비인 자리를 무엇으로 가리울고
꾀꼬리 노래하던 실버들 가지
꺾어서 채찍 삼고 가옵신 임아
<조지훈, 『별리(別離)』>
가옵신 임이 있거든 눈 오는 겨울 무섬을 찾을 일이다. 켜켜이 쌓인 추억, 시린 내성천 강바람에 실어 보내고 코트 깃 세워 홀로 외나무다리 건너 떠나왔던 곳으로 돌아가라, 사랑이 그대를 또 한 번속일지라도 사랑하고 또 사랑하라!

- 글쓴이 : 안경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