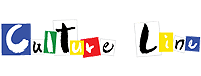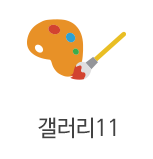문화포커스
- [김만동_영화이야기]홈 HOME(2009)
- 김만동
|
|
홈(home)
감독 글렌 클로즈 Glenn Close(영어 버전 나레이션 역) |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렸던 제15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COP15)가 19일 폐막했다. 첨예하게 대립하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들은 막판까지 미네 당기네 하다가 어정쩡하게 ‘정치적 합의’를 하기는 하였지만, 총회의 승인도 받지 못한 협정을 공식적으로 ‘유의’하자는 우스꽝스러운 결론을 내놓았을 뿐이다. 구속력 있는 온실가스 감축 합의안은 내년 멕시코시티 총회로 또다시 미루어졌다.
탐욕스레 지구를 상처내고 어질러온 나라들일수록 뒷수습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터인데, 그러지 않았다. 너나없이 책임을 다하려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 유감이었다. ‘지구 온난화와의 전쟁’을 위해 191개국이 12일 동안 머리를 맞댄 뒤라고 보기엔 초라하기 그지없는 결과이다.
코펜하겐 발 뉴스에 신경이 쏠려있는 동안 내내 머리를 떠나지 않는 영화가 있었다. 지난 ‘세계환경의 날’ 전 세계에서 동시에 개봉되었던 영화 「홈 HOME」이 그것이다. 이 영화를 만든 얀 아르튀스-베르트랑(Yann Arthus-Bertrand) 감독은 알다시피 유명한 항공사진 작가이다. 그의 책 「하늘에서 본 지구」(Earth from above, 2000)는 350만 부 이상 팔렸고, 2004년에는 우리나라에서 전시회가 열리기도 했다.









데이비스 구겐하임(Davis Guggenheim)의 환경 다큐멘터리 「불편한 진실」(An Inconvenient Truth, 2006)에서 영감을 얻었다는 베르트랑은 지구 구석구석을 찍기 위해 3년 동안 217회나 헬기를 타고 남아프리카공화국, 알래스카, 사우디아라비아, 남극, 아르헨티나, 북극, 호주, 방글라데시, 보츠와나, 브라질, 캐나다, 칠레, 아이티, 덴마크, 중국, 대한민국,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코스타리카, 스페인, 프랑스, 가봉, 그리스, 그린란드, 모리셔스, 도미니카 공화국, 인도, 인도네시아,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일본, 요르단, 카자흐스탄, 케냐, 마다가스카르, 몰디브, 모로코, 말리, 모리타니와, 지브롤터, 네팔, 나이지리아, 노르웨이, 뉴질랜드, 네덜란드, 카타르, 러시아, 차드, 시베리아, 스와질란드, 세네갈, 태국, 탄자니아, 우크라이나, 미국, 부르키나파소 등 56개국을 날았다. 그의 열의에 감복한 뤽 베송(Luc Besson)이 제작을 맡았는데, 이 영화의 극장 상영 및 DVD 판매를 통한 수익금은 얀 아르튀스-베르트랑이 세운 자선단체 ‘굿플래닛(GoodPlanet)'에 환경운동기금으로 전달되었다고 한다.
영화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타이틀이 뜨면 지구의 위성영상을 배경으로 내레이션이 시작된다. 우주의 신비인 지구는 40억 년 전에 나타났고, 우리 인간은 겨우 20만 년 전에 탄생했는데, 인간이 지구 생명체에 매우 중요한 균형을 파괴하고 있다. 지금부터 놀라운 이 이야기를 들려줄 테니 ‘호모사피엔스’인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잘 생각해 보라고 일깨운다. 영화의 처음 부분이다.
중간 부분에서는 우리 인간이 저질러온 탐욕과 부주의의 결과로 우리의 ‘홈home'인 지구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직면해 있는지를 차근차근 보여준다. 하늘을 날면서, 카메라는 원색의 우리 삶터를 놀랍도록 선명한 색깔과 잘 짜인 구도로 느리다 싶을 만큼 진지하게 부감한다. 부감하면서 영화를 이끌어가는 바탕 생각은 ‘가이아이론(Gaia theory)’이다. 지구상의 모든 생물과 무생물은 서로 관련되어 있고, 생명체는 각기 맡은 역할이 있어 균형을 이룬다는 저 제임스 러브록의 주장 말이다. 영화의 메시지를 좇아가 보자.
지구로부터 정말 필요한 것만 취하며 균형관계를 유지해오던 인류가 욕망과 허영을 부풀리면서 끊임없는 탐욕과 낭비와 안락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 것은 불과 1세기밖에 되지 않았다. 산업혁명 이래로 자본주의의 성찰 없는 경제성장은 우리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지경까지 끌고 와버렸다. 지구 곳곳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지만, 다른 한 쪽에서는 우리 생활에 필수인 지하자원을 마구 캐내고 있고, 약 10억 명 정도가 기아에 허덕이는데도 인류가 생산하는 곡물의 반 이상을 사료나 연료로 써버린다. 심지어는 지나치게 많은 고기를 생산하기 위해 매년 1,300만 헥타르의 숲을 파괴하고 있다. 과잉 생산은 소수를 잘 살게 만들었을지는 모르지만, 더 많은 다수를 굶주림으로 몰아넣는 죄를 저질렀다. 참말이지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다. 세계 부의 50%를 세계 인구의 2%가 쥐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서글픈 일인가?
어장의 75%가 줄거나 고갈되거나 사라질 위험에 처해있고, 지구의 6%를 차지하던 습지대가 지난 세기에만 50%나 사라졌으며, 홍수림 또한 전체의 50%가 줄었다. 운송, 산업, 산림벌채, 농업 등의 활동을 통해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고 대기는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40년 동안, 빙원의 두께가 40%나 얇아졌으며, 2015년이나 2030년쯤에는 완전히 사라질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면 2050년까지 지구 생명체의 25% 가량은 멸종될 수도 있다. 영구동토인 시베리아가 녹고 메탄가스가 방출되면 예측불허의 끔찍한 결과와 함께 통제 불능의 심각한 온실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기후의 시한폭탄이라고 하는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20배 이상 강력한 온실가스이다. 12,000년 넘게 기후의 균형 속에서 발전해왔지만 이제 그 균형이 깨질 위기에 처해버린 것이다. 석유가 곧 바닥날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인정조차 하려 하지 않는다. 브레이크가 고장 난 고물 자동차를 탄 꼴이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정말 얼마나 어리석은가?
이윽고 영화의 마지막 부분. 영화는 우리에게 손을 내민다. 지구가 끔찍한 영토로 변해가는 걸 막을 시간은 10년도 남지 않았다. 현실을 직시하고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모든 현상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나를 보여주는 것이다. 짜장 우리는 지구에게 너무 제멋대로 굴었다. 지구를 변화시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가 뿌린 씨를 우리가 거두자. 많은 걸 잃어버리긴 했지만 우리에겐 아직도 전 세계 숲의 절반, 수천 개의 강, 호수, 빙하, 수천 종의 생물체가 있다. 바로 거기에 해결책이 있다. 우리 모두에겐 변할 수 있는 힘이 있으니 지금 당장 시작하면 어떨까? 앞으로의 일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 지구를 살리는 일에 참여하자고 호소한다.
이 영화의 불편한 내용에 비해 너무도 아름다운 영상의 언밸런스는 일종의 역설이다. 색깔의 화려함이나 구도의 정밀함은 과연 베르트랑이라는 기림을 받기에 충분하다. 구겐하임의 「불편한 진실」이나, 헤더 로저스의 「사라진 내일 : 쓰레기는 어디로 갔을까」(Gone Tomorrow -The Hidden Life of Garbage, 2002)와 따지자면 비슷한 환경 다큐멘터리일 텐데, 전혀 다른 뉘앙스를 풍긴다. 글쎄, 개인적으로 나는 이게 훨씬 울림이 크다.
그런데 지구를 살리기 위해 우리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게 있을까? 소비를 줄이고 절약하여 쓰레기를 적게 만드는 것, 외식 등 고기 소비를 줄이고 소박하게 먹는 것, 냉방이나 난방 온도를 적절히 하여 화석 연료를 적게 쓰는 것, 자동차를 타기보다는 자주 걷거나 자전거를 타는 것, 물을 아껴 쓰고 낭비하지 않는 것, 나 하나보다는 우리 전체를 생각하는 것, 불신과 탐욕, 이익 대신 연민과 사랑, 부드러움을 간직하는 것, 등등 방법은 참으로 많을 것이다. 크리슈나무르티(Jiddu Krishnamurti)의 말처럼 ‘전 인류가 깨어있는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동시에’ 지구를 살리는 일에 나서야 할 때이다. 옴미기미기야야미기사바하.


- 글쓴이 : 김만동
- 안동 경덕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