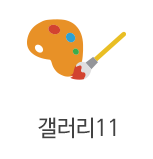문화포커스
- [남효선_동해연안의 문화여행]산불 잿더미 딛고 다시 일어서는 울진 ‘화동마을’
- 컬처라인(cultureline@naver.com)

동해연안의 생활문화
산불 잿더미 딛고 다시 일어서는 울진 ‘화동마을’
“새 집짓고 농새도 짓고 열심히 살아야지요.”
글. 남효선
9박 10일간 확산되면서 역대 최장 연소와 최대 피해 기록을 남긴 '울진산불'이 발생한지 37일 만인 4월 10일. 예기치 못한 산불이 강풍을 타고 순식간에 마을을 집어삼키면서 잿더미로 변한 경북 울진군 북면 신화2리 '화동마을'에 굴삭기와 집게차 등 중장비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중장비들이 화마에 흡사 종이상자처럼 구겨져 흉측한 몰골의 숯덩이로 남겨진 삶의 보금자리를 무너뜨리자 새카만 분진이 하늘로 솟는다. 금세 마을이 매캐한 탄 냄새로 뒤덮인다.
산불 발생 당시 맨몸으로 대피해 낯선 임시거주시설에서 뜬눈으로 지새다가 울진군과 경북도가 서둘러 조성한 임시주택으로 돌아온 피해주민들이 철거되는 집을 속절없이 바라보고 있다. 팔순의 할머니들 서넛이 임시주택 한 켠에서 보행기를 잡고 새카만 분진을 일으키며 철거되는 집을 바라보며 눈물을 훔치신다.
"조상대대로 물려받아 조상 모시면서 자식을 키우던 집이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변해 이렇게 중장비로 끌어내니 마음이 짠하니더."
엄섭 할머니(여, 83, 신화2리)가 연신 눈가를 훔친다.
"열여덟에 화동마을로 시집와 시부모들을 모시며 자식들을 키우던 집을 이제는 영영 볼 수 없잖니껴. 이런 모습 사진 많이 찍어서 내중에 꼭 보내주시소."
화동마을 노인회장을 맡아 산불이 마을을 덮친 이후 이웃들의 일을 자신의 일처럼 챙기며 잠 한 숨 제대로 못 이룬다는 주미자 할머니(여, 78)가 코로나19 방역마스크를 내리며 눈물을 훔친다. 한 할머니는 집이 철거되는 내내 눈길을 떼지 못한다. 엄섭 할머니가 보행기에 망(網)을 한 가득 싣고 철거가 한창인 마을 고샅길을 따라 나선다.
"이제 내 살던 집이 철거되는 모습을 봤으니께 밭에 나가 양대도 심고 망도 치고 먹고 살아야 되잖니껴. 그래도 울진군과 나라에서 이래 빨리 내 살던 마을에 임시주택을 지어주니 참말로 고맙니더."
엄섭 할머니 곁에 막내아들이 함께 따라나선다. 인근 부구리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막내아들은 휴일에 잠시 쉴 틈도 없이 고향으로 달려와 화마에 앗긴 아픈 생채기를 딛고 다시 밭으로 나가는 노모를 돕는다. 마을 고샅길을 지나 밭으로 가는 언덕에서 서서 엄섭 할머니는 숨을 고르며 한참을 서서 새카맣게 잿더미로 변해버린 마을을 힘없는 눈길로 바라본다. 엄섭 할머니네 밭이 있는 구싯골로 가는 길을 덮던 울창했던 송림은 선 채로 숯덩이가 된 채 위태롭게 서 있다. 엄섭 할머니가 끌고 가던 보행기를 멈추고 새카만 숯덩이로 변한 아름드리 소나무 아래 둔덕에 앉아 잠시 숨을 돌린다.
"새색시 때 여기에 참꽃이 참 흐드러지게 폈니더. 농새일을 앞두고 참꽃이 피면 동네 새각시들이 모여 저기 저 거랑(개울) 가에서 지지미(부침) 부쳐 먹고 솥단지 두들기며 노래 부르고, 꽃놀이(화전놀이)도 하고..."
엄섭 할머니가 앉은 자리 곁 화마가 할퀴고 간 새카만 숯덩이 위에서 현호색이 남색 꽃봉오리를 열고 있다. 새 희망을 일구듯 남빛 속살을 여는 현호색의 꽃봉오리가 평생 농촌과 자식을 지키며 거두어 온 우리네 어머니의 속내를 닮았다.
"산불이 나던 날 허겁지겁 맨몸으로 쫓겨 임시거주시설에서 뜬 눈으로 지새다가 26일 만에 울진군에서 마을에 지어준 임시주택에 들어와 잿더미로 변한 집과 마을을 보니까 눈물밖에 안나디더. 그래도 살아야 되잖니껴. 농새철인데 때맞춰 종자를 심어야 조상 제사도 모시고 객지나간 자식새끼들 철마다 나는 곡식도 노나 주고... 마을로 돌아온 다음날부터 밭에 나가 일하니더."
엄섭 할머니와 막내아들이 준비해 온 그물망을 익숙한 솜씨로 둘러친다.
"동네에 그 많던 대나무도 산불로 전부 다 타버려 며칠 전 울진장에 가서 지줏대를 새로 사왔니더. 새집 짓고 살라면 열심히 해야지요. 자식들이 돈을 모아 집을 새로 짓는다고 하니까 뭐던 열심히 해서 다시 잘 살아야지요."
엄섭 할머니가 그물망을 지줏대로 단단히 옭아매며 환하게 웃는다.
"산불에 쫓겨 덕구호텔에 임시로 살 때는 잠 한 숨도 못 잤는데, 스무엿새 만에 마을에 만든 임시주택에 들어오니까, 내 살던 집만큼은 못해도 그래도 두 발 뻗고 잤니더."
"평생 서로 도와가며 살던 이웃들이 다시 마을에 돌아오니 이제 살 것 같니더."
엄섭 할머니 밭과 둔덕을 나란히 한 이웃 밭에서 도라지를 심던 심분섭 할머니가 마을 사람들이 다시 돌아온 게 제일 좋다며 활짝 웃는다.
마을 전체가 잿더미로 변한 화동마을은 지난 4월 7일 부터 복구를 위한 철거에 들어갔다. 화동마을은 산불에 쫓겨 낯선 임시거주시설에서 마을에 조성된 임시주택으로 돌아 온 지난 달 29일 다음 날에 주민들이 함께 모여 마을지킴이인 성황제사와 지신고사를 지냈다. 임시주택 한 켠에는 화마를 용케 견뎌낸 장독들이 가지런하게 자리 잡고 바깥 화덕도 새로 마련하는 등 세간살이가 하나 둘 갖춰지면서 주민들도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하는 모습이다. 전호동 화동마을 이장은 "이번 산불로 마을 전체가 잿더미로 변해 살 길이 막막하지만 다시 마을을 꾸리고 주민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준 울진군과 군민들의 노력을 모아 마을을 다시 일으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자신의 일처럼 마음과 정성을 모아 준 군민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투명한 하늘 아래, 아침의 볕은 창을 닦고 한낮의 볕은 과실에게 단물을 뭉쳐준다. 그러나 바람이 불면 매캐한 화근내가 딸려와 눈이 질끈 감긴다. 초록보다 시커먼 화마의 상흔이 먼저 들어오고 겨우 일어나 악물어 보지만 재 묻은 돌, 뼈대만 남은 집, 이제는 영영 사라진 부모님의 흑백 사진... 상실은 날마다 새롭게 발견되어 등 뒤에 달라붙는다.
우리는 여전히 그 속에 있지만 그래도 봄이다. 돌복상나무의 연분홍 속살, 빗소리에 깨어난 대지, 벼포기 붙잡고 우는 청개구리, 네잎 클로버를 본 아이들의 짧은 탄성소리 그리고 자박자박 걸어오는 발걸음 소리. 시간을 되돌려 그랬더라면이라고 말하는 대신 가슴의 돌덩이를 같이 들자고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이 곁에 있다. 심분섭 할머니의 말씀대로 제일 반가운 건 함께 살던 사람들이 다시 모여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두런두런 화전놀이 추억을 나누고 다시 돌미역을 따고, 송이를 기다릴 것이다. 이것은 패배하지 않은 사람들이 봄을 맞는 방법. 스스로 솟아나는 것들의 대한 이야기. 화동마을은 지금 신화(新花)로 분주하다.

- 글쓴이 : 남효선
- 경북 울진에서 태어났다. 동국대학교 국문학과를 졸업했으며, 안동대학교 대학원에서 민속학을 공부하였다. 1989년 문학사상의 시 부문에서 신인상 수상으로 등단하였다. 한국작가회의, 경북작가회의, 안동참꽃문학회 등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시집으로 『둘게삼』이 있다. 현재 시민사회신문의 전국본부장으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