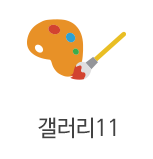문화포커스
- [강병두_구름에 달 가듯이]도평장을 찾아 나서며..
- 컬처라인(cultureline@naver.com)

청송장터구경
도평장을 찾아 나서며..
글, 사진. 강병두
들판에 드문드문 초록이 살찌는가 싶더니, 찰랑 거리는 논물 사이로 바람을 따라 다니는 여린 모들이 깔깔거린다. 지난 몇 달간 멈춘 듯 살아야 하는 사람과 다르게, 자연은 제 삶을 챙기느라 분주하다. 처마 아래 둥지에는 제비 새끼가 부리를 내밀고 있고, 아직 여물지 않은 곱실곱실한 깃털로 이소 준비를 하는 새끼 참새와 멀지 않은 곳에서 어미를 부르는 새끼 고양이의 울음소리가 작지만 간절하다.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이 맘 때 세상은 온통 어린 것들의 잔치이다. 이에 뒤섞여 마음도 순해지면 좋으련만 재난문자 알림음이 낯선 하루를 밀고 가야 하는 것은 사람뿐이라고 어깃장을 놓는다. 일상을 바투 쥐고 사는 일에 다시 골똘해지고 만다.
전국적으로 감염병이 좀처럼 잦아들지 않는 상황에 장터를 찾는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행불행이 생의 조건이듯 이번 난(難)도 삶의 일부이니 남겨두고 싶었다. 몇 번의 고민 끝에 거리를 유지하고 떨어져 천천히 둘러본다는 생각으로 도평장으로 나섰다.
 (8).jpg)
입구서부터 보이는 현수막이 현 상황이 얼마나 위중한지 알려준다.
[전통시장 5일장 폐쇄. 코로나-19종료 시까지 임시 휴장합니다.]
늘 보아온 장터와 다른 풍경에 당혹감이 쏟아진다. 난장을 펴고 있는 사람이나 때 꺼리를 찾아 장에 온 시골 노인들이나 마스크를 쓴 채 이뤄지는 흥정이 서툴기만 하다. 손짓을 주고받으며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 당혹감이 묻어난다.
 (7).jpg)
20여년 장을 돌며 신발을 팔았다는 조광재(70)씨는 이곳이 청송이 고향이라 이제 다른 장에는 가지 않는다고 한다. 그리고 덧붙이는 한마디는
“나도 딴 데 못가고, 다른 곳에 사는 장꾼들도 여 못 와! 서로 조심하고 살아야재.”
모이는 걸 못하게 하고, 외지인들이 들어오면 불안하고 위험하다는 생각이 더해지니 장이 깨지는 일이 다반사. 정식으로 열리는 장은 아니고 소규모 품앗이 장이 열렸을 뿐이다. 씨앗노점 할매는 펼쳐 놓기만 했지 사는 사람이 없단다. 어쩌다 하나 팔리면 몇 백 원이 다다. 안타까운 마음에 쪼그려 앉아 할매의 손을 물끄러미 바라보자 마음을 읽은 듯 말씀하신다.
 (4).jpg)
“그래도 사람 볼 수 있잖아. 이래라도 보고 살아야지...” 하신다.
장터를 돌다가 출출해 식당에 들어서니 아까 본 신발장사 하시는 분이 혼자 술잔을 기울이고 계신다. 장사도 안 되고 목이나 축일까 해서 자리 잡았다며 울적한 마음을 꺼내 보이신다. 잠시 대작이라도 해 드릴 요량으로 맞은편에 앉았다. 이난리가 얼마나 오래 갈지? 다른 지역은 어떤지? 정부에서는 무엇을 하는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한 게 너무 많으신데, 나도 꿀 먹은 벙어리. 시원한 답 없이 대작하며 한탄만 듣다가 나왔다.
 (2).jpg)
입구에서부터 장터에 들어갈까 말까를 망설이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을 만났다. 앞선 할아버지께서는 들어가자고 재촉을 하시고 있고, 뒤 따르시는 할머니들께서는 선뜻 내키지가 않으신가 보다. 옥신각신이 이어지다 장으로 들어가신다. 이런 풍경이 자주 반복된다. 아침부터 나와서 한나절이 지나도록 장을 돌고 또 돌아보지만 어느 곳에도 활기는 없다. 비닐 포장으로 덮인 물건들, 열지 못한 점포들 사이를 힐끗거리며 걸어본다. 예전에 이곳을 들고 나며 북적거리는 풍경을 빚어냈을 장꾼들의 발자국을 상상하며 처연과 적막을 밀어내 보지만 걸음은 자꾸 잠기기만 한다.
 (3).jpg)
‘오늘은 확진자가 몇이나...’ 정류장에서 휴대전화를 꺼내는데, “우야꼬! 여서 보네.” 하는 목소리에 저절로 고개가 돌아간다. 비슷한 차림의 아주머니 두 분이 시선을 나누고 있다. 마스크를 썼지만 한눈에 서로를 알아본다. 어떻게 나왔냐며 목소리가 마스크를 뚫고 인사하자, 얼굴이 좋아 보인다는 인사가 되돌아온다. “그게 보이요?” 두 분이 각자의 몸짓으로 웃으신다. 주변의 공기가 순식간에 뭉그러진다.
 (5).jpg)
오늘이 깔딱고개일까 내일이 깔딱고개일까, 아니면 아직 멀었을까. 보이지 않아 고약하고, 약자와 궁지에 몰린 자들을 차례로 씹는 교활하고 악랄한 바이러스의 등장 이후로 불투명한 미래가 주는 막막하고 괴괴한 감정에 시달린다. 그러나 함께 넘고 있는 이웃이 있고 그들 덕에 안전을 확인하며 간간이 웃는다. 노력이 수포로 돌아오는 상황을 마주치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서로를 지켜주기 위해 기꺼이 유리장벽 속에서 제한과 제재를 감당한다.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우리뿐이라며, 다시 힘을 낸다. 돈을 풀고, 교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하루를 굴려 계절을 건넌다.
 (6).jpg)
기다린다는 것은 꼭 온다고 한다. 기다린다는 것은 희망을 버리지 않고, 믿음을 꺾지 않겠다는 약속이므로 바뀌는 것을 보고야 만다고. 의지가 녹아있는 기다림만큼 힘센 것도 없어서 꼭 되돌려 받고야 만다고. 그러고 보니 마스크 너머의 나를 알아주는 이웃이 있는 한 우리의 끈기도 쉽게 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게 된다. 짙어진 아카시향 뒤로 멀리, 버스가 보였다.
 (1).jpg)

- 글쓴이 : 강병두
- 세 차례의 개인전을 비롯하여 '사진의 의미와 재현', '수화위진'전 등 다수의 단체전에 작품을 발표하였다. 현재 안동신문 문화학교 사진교실 강사로 활동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