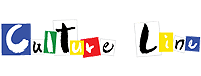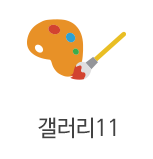문화포커스
- [정창식_마을이 있는 문경시]문경새재아리랑마을
- 컬처라인(cultureline@naver.com)

마을이 있는 풍경
문경새재아리랑마을
글 정창식, 사진 김정미
문경새재는 큰 고개다. 고개는 사람들이 넘나드는 길이다. 고개 너머는 넘고자 했던, 넘어야만 하는 그 무엇이 존재한다. 고개를 넘고서야 사람들이 비로소 기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지만 고개를 넘는 일은 정말 지난한 일이다. 가빠오는 숨과 오랜 보행에서 느껴지는 다리의 통증 그리고 은밀하고 좁은 모퉁이 길에서 마주하는 낯섦과 두려움 등의 감정들은 여간한 일이 아니다. 교통수단이 걷는 것 외에 마땅치 않던 그 옛날에는 이러한 일들이 일상이었을 것이다.
그래, 이 길은 걸었어야 옳았다. 새재는 길이고 길은 걸어야 하기 때문이다. 새재 입구에 있는 하초리(下草里), 즉 아랫푸실 마을을 그런 마음으로 들어갔다. 입구에는 ‘문경새재아리랑마을’이라는 표지석이 세워져 있다. 2014년에 문경시와 문경문화원에서는 이 마을을 ‘문경새재아리랑마을’로 지정하고 입구에 표지석을 세운 것이다.
마을에 들어서자, 고즈넉하고 한가한 옛 마을의 정경과는 다른 최근에 세워진 듯한 카페와 레스토랑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
“옛 집을 고쳐 한옥식 레스토랑과 옆에 이층 카페를 새로 지었어요.”
이 마을에서 자란 젊은 사장이 건강한 웃음으로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다. 적지 않은 이들이 이곳을 찾는 듯했다. 하얀색 카페건물 뒤로 주흘산 봉우리가 보였다. 그러고 보니, 카페의 상호 도안과 주흘산의 모습이 닮아보였다. 그는 쑥스러운 듯 주흘산을 형상화해서 만들었다고 말한다. 이층 카페에서 마을 입구의 잘생긴 소나무들을 바라보고만 있으면, 이곳이 문경새재아리랑마을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없다. 카페를 나와 마을 위로 더 들어갔다.
새재 입구에 있으면서 주흘산 아래에 위치한 마을은 의외로 가구 수가 많고 넓은 듯 했다. 한옥으로 지은 마을회관이 한가운데에 있었다. 이곳에서는 지역주민들이 ‘문경새재아리랑보존회’를 만들어 새재아리랑 보존을 위한 활동을 도모하고 있다. 마을회관은 다양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장소가 되고 있었다.
마을회관 왼쪽 골목으로 들어섰다. 길게 이어진 골목길이 마치 고갯길처럼 보였다. 벽에 문경새재아리랑 소리꾼으로 널리 알려진 고 송영철 옹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다. 그리고 기관단체장들과 지역 인사들이 직접 쓴 아리랑에 관한 글귀들도 있었다. “길 위의 노래, 고개의 소리"라는 글이 눈에 들어왔다. 그제야 이 마을이 ‘문경새재아리랑마을’이라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었다.
“젊은 시절 곶감을 팔기 위해 새재를 넘어 수안보 장을 보러가면서 즐겨 부르곤 했었어.”
이 마을에 살았던 문경새재아리랑 소리꾼 송영철 할아버지가 생전에 한 말이다. 그는 이 마을에서 평생을 살면서 아리랑, ‘문경새재아리랑’을 즐겨 불렀다. 아리랑은 고갯길을 넘을 때에만 부른 것은 아니었다. 그는 높고 험하기로 이름 난 마을 뒷산인 주흘산을 수시로 들고났다. 그 시절에는 나무 한 짐은 곧 생계(生計), 즉 삶의 경계(境界) 같은 것이었다. 그만큼 귀한 연료였다. 그가 주흘산의 이름 모를 골짜기를 셀 수 없이 헤매면서도 지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저 아리랑이었다.
“혼자서도 부르고 셋이서 부르고 남자들이 주로 불렀어요.”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문경새재아리랑은 새재 주변에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일상의 노래였다. 그는 해방 전 징용생활을 했던 북해도의 탄광에서, 6·25의 전쟁터에서도 우리 문경새재아리랑을 불렀다고 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유독 그를 문경새재아리랑의 소리꾼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일까.
“그분이 노래도 잘하시고 인물도 좋으시고 키도 크시고 목소리도 구성지고 마을 장례에는 선소리도 잘했어요.”
이웃주민들이 송영철 할아버지에 대해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다. 그는 ‘송풍월’이라고 불렀던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능으로 타고난 소리꾼이었던 것이다. 무학이었으면서도 소설을 즐겨 읽었고 여러 노랫말들을 잊지 않기 위해 종이에 적어두는 번거로움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가 세상에 드러난 것은 1995년 제3회 향토민요경창대회에서 ‘새재아리랑’으로 전년도의 차하상에 이어 장원을 수상하고서였다.
“문경아 새재에 물박달나무 / 홍두깨 방망이로 다 나가네”
그가 기억하는 아리랑에는 문경새재에서 자생하는 나무이름들이 나온다. 쇠무풀리나무, 참사리 낭구, 뿌억싸리... 이들은 홍두깨가 되고, 말채쇠채가 되고, 곶감 꼬지가 되고, 북어 꼬지가 되어 팔려나갔다. 그래서 문경새재아리랑은 그 시절 남자들의 노동요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지금 공군박물관 관장인 전 문경새재 옛길박물관 안태현 학예사는 송영철 옹의 소리를 ‘황소처럼 무디고 유장한 가락’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2001년 12월 겨울 아랫푸실 마을 뒷산, 주흘산 자락에 묻혔다.
평생을 마을 사람들의 선소리꾼으로 봉사했던 그는 마을사람들이 이끄는 상여에 실려 다른 선소리꾼의 애절한 소리와 함께 떠났다.
문경시와 문경문화원은 소리꾼 송영철 할아버지가 평생을 불렀던 문경새재아리랑으로 지역문화의 맥을 이어가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 2019년 가을에는 문경문화원에서 주관하는 제12회 ‘문경새재아리랑제’가 문경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고, 지역주민들이 만든 ‘문경새재아리랑보존회’ 등에서는 서울아리랑페스티벌에 참가하여 이를 널리 알리고 있다.
마을의 끝에서 ‘주흘산로’라는 이정표를 보았다. 그 길은 마을의 끝이지만 주흘산으로 들어가는 시작이기도 하다. 그는 생전에 저 ‘주흘산로’를 따라 지게를 지고 산골짜기로 들어섰을 것이다. 아마도 그의 문경새재아리랑은 그곳에서 더욱 ‘황소처럼 무디고 유장한 가락’으로 더욱 넓게 퍼져갔을 것이다.
봄색 가득한 주흘산과 하초리, 아랫푸실 마을을 뒤로하고 마을길을 걸어 나왔다. 어디선가 선뜻 바람이 불어왔다. 봄바람에 그가 불렀던 문경새재아리랑이 실려 오는 듯했다. 잠시 멈춰 눈을 감고 가만히 들어보았다.
문경새재 왠 고갠가
구비야 구비야 눈물이 나네
문경새재 물박달나무
홍두깨 방망이로 다 나간다
홍두깨 방망이 팔자가 좋아
큰 애기 손길에 놀아나네...
(중략)

- 글쓴이 : 정창식
- ▪ 현 문경문화원 이사 ▪ 안동대학교 문화산업전문대학원에서 스토리텔링을 전공하였다. [주간문경]에 문경문화와 관련된 글을 연재하고 있다. 문경의 자연과 마을, 유적과 문화재 그리고 오래된 이야기들을 새롭게 봄으로써 문경문화의 가치를 높이고 싶어한다. ▪ 저서 수필집 "아름다운 선물 101" (2010) 에세이집 『아름다운 선물 101』 은 우리 인생에서 있어서 스치는 인연들과의 소중한 관계, 베풂의 마음 등 일상에서 느낀 감정들을 엮은 책이다. 수필집 "문경도처유상수" (2016) 주간문경에 2010년부터 연재하고 있는 문경문화와 관련된 글 중 57편을 선별해 책으로 엮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