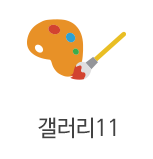문화포커스
- [황구하_시로 거니는 상주]내 마음의 원적
- 컬처라인(cultureline@naver.com)

시로 거니는 상주
내 마음의 원적
글 황구하

상강 지나면서 날씨가 급격히 추워지더니 어느새 11월, 가을도 깊을 대로 깊었습니다. 어젯밤 숙직을 하고 온 남편은 집에 오자마자 “야, 날씨가 이케 단박에 추워질 수 있나. 이러다 금방 겨울 오겠다. 단풍이 많이 들었던데 화북 쪽으로 한 바퀴 돌자.” 했지요. 그 무덥던 여름이 언제 있기나 했는지 무색하게도 벌써 춥다, 춥다 소리가 나옵니다.
작년 이맘때, 일이 많았습니다. 몸 상태가 예사롭지 않은 남편은 급기야 만성신부전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고혈압과 당뇨가 있어서 평소에도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썼는데요. 몸이 자주 붓고 할 때 병원을 가봐야 한다고 걱정을 하고 종용해도 “괜찮아, 괜찮아” 하더니 병을 키운 것입니다. 큰 병원에 입원을 하고 온갖 검사와 의사의 진단과 처방, 그리고 환자 보호자 교육이 함께 진행됐습니다. 장기이식 대기자로 등록도 했습니다. 엉겁결에 닥친 상황이 마치 거짓만 같았습니다.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가슴이 쿵쿵거리고 떨려서 불면증에 시달려야 했으니까요.
병원에 있을 때 딸내미가 웨딩촬영 날짜가 잡혔다고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중국에 있는 사위가 들어오는 날을 맞추다 보니 일주일 뒤로 일정을 잡았다는 거였습니다. 아들내미한테만 알리고 남편의 건강, 입원한 일 등은 다른 가족들한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딸내미가 그늘진 얼굴로 웨딩촬영을 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딸내미가 무사히 일정을 마치고 모교에 강의 일정이 있어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부랴부랴 집으로 와 딸내미와 하룻밤을 같이 지냈습니다. “아빠는?” 하는데 “오늘 숙직.” 얼버무렸지요. 강의를 마치고 집으로 온 딸내미와 터미널로 가는 길, 차분하게 남편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딸내미는 서울행 고속버스 안에서 큰소리도 내지 못하고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딸내미의 손을 잡고 등을 쓸어주면서 나도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정작 남편은 자신의 상황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파도 내 삶이고 힘들어도 내 삶이라며 오히려 가족들을 안심시킵니다.
속리산 아래 턱 화북면 상오리 가는 길은 만산홍엽이었습니다. 붉은빛, 노란빛, 녹두빛으로 짙게 물든 나뭇잎부터 연한 노랑, 연한 연두, 연한 분홍 등 가볍게 물든 이파리들이 바람 불면 나비가 되고 새가 되어 훨훨 날아다녔습니다.

화북에는 담배농사를 많이 짓는데요. 담배밭을 지나며 담배꽃을 처음 봤습니다. “담배꽃은 담배 향이 날까?” 했더니 남편은 “향을 한번 맡아봐. 아니 피워봐야 하나?” 했지요. 꽃잎 하나를 따서 향을 맡아보니 독한 담배 향은 나지 않고 은은한 향이 배어나왔습니다. “꽃이 이렇게 예쁜데 어떻게 쓴 담배가 될까. 당신이 이 꽃 한번 피워볼규?” “인생이 다 그런 거여. 쓴맛을 알아야 단맛도 알지. 담배 끊은 지가 언젠디.”
남편은 발그레 웃었지만 어쩌면 술, 담배로 스트레스를 풀기도 했을 텐데, 이제는 음식 조절과 생활을 소박하게 하는 데서부터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있으니 문득, 담배꽃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여름에 시원스레 물의 북을 울리던 ‘금란정’ 정자 아래 장각폭포 물도 깊고 그윽하고 고요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언제라도 올 때마다 물소리도 다르고 빛도 다르고 물의 폭도 다르게 느껴지지요.

장각폭포
장각폭포 위쪽 ‘신선마을’ 가는 길은 공사가 한창이었습니다. 길을 넓히는 중이었는데요. 꼬부랑길을 사박사박 걸어 다니던 생각을 하니 공사하는 게 좀 아쉬웠습니다. 지난여름에 왔을 때 들녘에 전봇대와 전깃줄을 타고 오르던 담쟁이넝쿨이 두 팔 벌린 성자의 모습이었는데요. 담쟁이넝쿨 성자도 어느새 단풍이 들고 있었습니다.
동네 입구 오른쪽 둔덕으로 높게 오르는 계단이 있습니다. 이 80계단을 오르면 상오리 칠층석탑이 홀로 우뚝 서서 하늘과 맞닿아 있습니다. 상오리 칠층석탑은 신라 하대 또는 고려 시대 탑이라고 하는데 뭔가 뭉툭하고 기우뚱해 보이면서도 균형감을 유지해 매우 정직하고 씩씩하게 자라나는 메타세쿼이아 나무를 연상케 합니다.
 |
 |
상오리 칠층석탑은 일제강점기에 도굴이 되고 그냥 널브러져 있던 걸 1977년에 다시 쌓아올렸다고 하는데요. 오래전 상주 문화재 관련 책을 보다가 사진으로 먼저 만났습니다. 그 이후 상오리 칠층석탑을 직접 만나면서 가슴에 품었는데요. 내 마음에 쟁이고 숨겨놓은 곳으로 칭하는 상주 풍경 몇 군데가 있는데 이곳도 그중 하나입니다. 스스로 정한 내 마음의 원적이지요.
지난여름 지리산 이원규 시인이 은척 동학교당 답사를 와서 동행한 적이 있습니다. 동학(東學) 남접교주 김주희의 며느님 곽아기 할머니와 김정선 접장을 만나고 나오는 길 상오리 칠층석탑으로 안내를 했지요. 이원규 시인은 요즘 별 사진을 담으면서 자연과 우주의 언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곳 풍경이 그의 혜안에 딱 걸려들 것을 짐작했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는 모터사이클을 몰고 상주에서 경주로 그리고 다음날 밤 다시 상주로 와서 상오리 칠층석탑에 내리는 별을 담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 걸어 다니는 하나씩의 석탑입니다. 석탑이 석탑에게 말을 걸고 악수를 하며 언제 술 한 잔 하자며 안부를 묻습니다. …폐사지의 석탑, 천년의 돌에 뜨거운 피가 도는 아침입니다.
7월 14일 이원규 시인의 페이스북에 상오리 칠층석탑 별 사진과 함께 글이 올라왔는데요. 8월 11일 제 시집 『화명』과 산문집 『바다로 가는 나무』 북 콘서트를 앞둔 며칠 전 지리산에서 택배가 왔습니다. 커다란 물품이라 받기도 버거웠는데요. 포장을 뜯고는 나도 모르게 두 손 모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찍었다는 상오리 칠층석탑의 별 사진이었습니다.
사벌국(沙伐國)에 젊고 당당한 느티나무 한 그루 서 있다. 경북 상주에 뿌리내린 지 어언 30년의 이 나무는 낙동강 “물고기 부족”이다. 한밤중에 소처럼 울다가 문득 깊푸른 눈빛으로 세상을 본다. 나뭇잎 물고기들과 함께 공중 헤엄치며 영토를 넓힌다. 그리하여 그 모든 “꿈꾸는 것들은 비린내가 난다”.
황구하 시인은 낮은 목소리로, 상주의 탯말로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을 아프게 받아 적는다. 만물동근(萬物同根)의 시 세계다. 처녀치마, 노루귀를 보며 “사람도 짐승도 꽃”이라는 사실에 주목한다. 화엄과 화쟁의 세계를 늙은 호박의 몸을 통해 보여준다. “소리가 소리를 키우는 눈부신 고요”라는 화명(和鳴)으로 즉문즉답한다.
때로는 외발로 오래 서 있는 북천 두루미에게 “졌다”며 능청을 떨지만, 사벌국의 이 느티나무는 “평지가” “비탈”인 시절에 오히려 더 꼿꼿하다. 어느새 “세상을 반듯하게 펴”는 어머니의 흰 고무신을 신고 있기 때문이다. 절망 속에서도 해학을 잃지 않으며 “엎드려 밭매듯이” 시를 쓰는 황구하 시인. 상주 매협묵집에 가서 “만 원이면 만사”인 메밀묵밥과 골패묵, 막걸리 한 병을 “만화방창” 사주고 싶다.
이원규 시인은 제 시집 『화명』에 과분한 약평을 써주셨는데요. 북 콘서트 하는 날에는 시베리아에 있을 거라 참석하지 못해 아쉽다고 하더니 떠나기 전 그의 예쁜 아내 신희지 선생한테 부탁해 사진을 보내온 것입니다.

상오리 칠층석탑_이원규 시인 사진
한참을 먹먹하게 앉아 있다가 전화를 했는데 신희지 선생의 말은 더욱 감격스러웠습니다. 사진을 인화해서 액자에 넣어놓았는데 어느 분이 마침 그곳 ‘예술곳간 몽유’에 왔다가 그 사진을 사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미안하다고, 첫 번째로 갈 곳이 있다고 했다네요. 사실 곧 사진 전시회가 열리면 상오리 칠층석탑 별 사진을 모셔 오리라 마음먹었는데 그만 뭉클했지요. “천년의 돌에 뜨거운 피가 도는” 그 사진은 벽에 걸지 않고 지금 제 서재 한쪽 책장에 기대어 놓았습니다. 수시로 그 앞에 앉아 합장을 하곤 하는데요. 아무것도 그 무엇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두 손을 모아보는 것이지요. 지금 여기 내 삶과 맞닥뜨린 현실 그 모든 사람들이 고마울 뿐입니다.
올해 큰일을 많이 치렀습니다. 초봄 딸내미의 결혼과 출국이 있었고 남편의 건강 악화로 봄 내내 서울 큰 병원을 오르락내리락했습니다. 그리고 초여름부터 시집과 산문집을 출판하기 위한 원고 정리를 시작하고 편집과 교정을 하느라 폭염 속에서 진땀을 뺐습니다. 첫 시집 이후 7년 만에 두 번째로 묶는 시집이고 산문집은 처음으로 내는 건데 한꺼번에 정리를 하려니 더 힘이 들었지요. 책이 나오고 팔월 중순, 많은 분들과 외롭지 않게 북 콘서트를 치르고 나니 어느새 처서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상오리 칠층석탑 앞에 서서 두 손 모으고 일곱 번의 절을 했습니다. 한 층 한 층마다 절을 올리다 보니 일곱 번이 되었습니다. 탑을 쌓는 마음을 생각해봅니다. 탑은 고대 이정표 역할로 그 기원을 찾기도 합니다. 또 지붕돌 아래로 빗물이 타고 흐르는 것을 막기 위하여 돌에 각을 주거나 일부러 홈을 파 넣기도 한다는데요. 사람이 살아가는 이치가 이와 다를 바 없습니다. 삶의 굽이굽이 고비도 한 층 한 층 풍화되며 쌓이고 또 한 층 한 층 귀한 일도 침식되며 쌓여집니다. 길을 잃고 고비를 만날 때마다, 귀하고 소중한 일을 만날 때마다 한층 더 나를 허물고 끝없이 낮추어 한층 더 너른 탑의 터전을 다지며 살아야겠다 새겨봅니다.
석탑 주변에 향내 짙게 피었던 방아꽃 무리도 시들고 개망초, 강아지풀도 무성히 말라가고 있습니다. 상오리 칠층석탑 뒤편 감나무도 노을빛으로 물들어 여여한 말씀을 들려줍니다. 내 마음의 원적, “폐사지의 석탑, 천년의 돌에 뜨거운 피가 도는” 늦가을입니다.


- 글쓴이 : 황구하
- 충남 금산에서 태어났다. 영남대학교 대학원 철학과(동양철학 전공)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2004년 『자유문학』으로 등단하였다. 시집 『물에 뜬 달』이 있으며 현재 반년간지 『시에티카』 편집국장으로 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