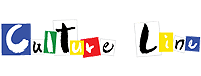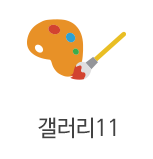문화포커스
- [남효선_동해연안의 문화여행]울진이 펼치는 대풍헌(待風軒) 수토사 뱃길재현
- 남효선(cultureline@naver.com)
울진이 펼치는 대풍헌(待風軒) 수토사 뱃길재현
구산항 대풍헌은 조선조 ‘울릉 ‧ 독도실질지배’ 현장
남 효 선

❙ 수토사 행렬
경북 울진군 기성면 구산항은 한반도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빼 놓을 수 없는 소중한 역사적 현장이다. 특히 한반도의 부속 영토인 울릉도와 독도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논하는 자리에서 구산항은 가장 으뜸의 자리에 놓인다. ‘국토영유권’의 현장이자 ‘울릉 ‧ 독도 실질지배’의 역사성을 입증하는 대풍헌(待風軒 경북도 기념물 제165호 2010년3월11일 지정)이 위치한 곳이기 때문이다. 대풍헌의 또 다른 이름은 구산동사(丘山洞舍)이다.
지난 2010년 울진군이 대풍헌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상량문에 ‘함풍 원년(咸豊元年) 신해(1851년) 3월 초 2일 사시(오전 9∼11시)에 입주하고 술시(오후 7∼9시)에 상량한다’는 내용으로 미루어 본 건물은 1851년 이전에 지어진 것으로 확인된다.

❙ 대풍헌 상량
현재 복원된 대풍헌은 정면 4칸, 측면 3칸의 와가(瓦家)로 우측 칸에 전면 퇴를 두고 온돌방을 두었으며 좌측은 모두 마루를 깔아 대청을 두었다. 5량가(五樑架)의 팔작 와가이다.
조선조 당시 울릉 ‧ 독도를 수토하기 위한 수토사가 배를 띄우기 전까지 머물던 숙영건물로 사용됐으며, 현재까지 구산동(구산포)의 노반계(老班契) 회의장소와 마을 동사(洞舍)로 활용되어 왔다.

❙수토사 출정식

❙ 수토사 고유제
지난 5월 20일 오전 '독도 영토수호 전진기지'인 경북 울진군 기성면 구산항 대풍헌(待風軒)에서 울진군(군수 임광원)이 경북도, 울진문화원와 함께 '울진 수토사(搜討使) 뱃길 재현' 퍼포먼스를 펼치며 독도 실질 지배의 역사성과 독도 수호 의지를 다졌다. 이 행사는 지난 2013년 처음 ‘뱃길 재현’ 퍼포먼스를 펼친 이래 올해로 4회째이다.
이날 '울진 수토사 뱃길 재현'은 울릉 ‧ 독도 실질지배 현장인 평해읍 월송리 월송포진에서 독도 수토를 위해 출정하던 기성면 구산리 대풍헌까지 펼쳐졌던 거리 행렬과 뱃길 재현, 학술탐사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울진 수토사 뱃길 재현'은 울진군(군수 임광원)이 주최하고 울진문화원이 주관했으며 경북도가 후원했다. 이날 뱃길 재현은 경북미래문화재단이 연출하고 후포고등학교 학생, 해군부대 장병들이 출연했다.
수토(搜討)는 어느 지역을 수색하고 토벌한다는 뜻으로, 1693년 안용복 사건(1693년(숙종 19) 고기를 잡기 위해 울릉도에 들어갔던 안용복이 이곳을 침입한 일본 어민을 힐책하다가 일본으로 잡혀가고, 이를 계기로 조선과 일본이 울릉도를 둘러싸고 영유권 분쟁을 벌였던 일)이후 조선이 삼척영장(三陟營將)과 월송만호(越松萬戶)를 수토사로 임명해 2~3년마다 울릉도와 독도를 실질 지배한 국토영유권 확보를 위한 국가정책이었다.
구산리 소재 대풍헌(待風軒)은 삼척영장과 월송만호가 울릉 ‧ 독도에 대한 수토를 위해 출정을 기다리던 주둔지로서 완문(完文, 1871년)과 수토절목(搜討節目, 1883년) 등의 고문서가 이곳에서 발굴되면서 우리나라가 울릉도와 독도를 실질적으로 관리. 지배해왔음을 밝혀주는 국토영유권의 현장이다.
임광원 울진군수는 “수토사 뱃길 재현 행사와 함께 대풍헌 일원에 기념관을 짓는 등 수토문화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앞으로 국토영유권의 현장인 울진의 수토 유적지를 널리 알리고, 국토방위를 위한 역사 교육.관광의 장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 대풍헌 고문서 _ 왼)완문 오)수토절목
◆ 대풍헌 소장 ‘수토절목(搜討節目)’은 무엇을 담고 있나
대풍헌이 일본 독도 만행의 역사적 왜곡을 입증하는 역사적 현장으로 주목받게 된 시점은 지난 1988년 안동대민속학연구소의 ‘울진의 문화재’ 연구 용역 수행과정(권삼문, 남효선 조사)에서 최초로 확인된 후 당시 구미시 학예사였던 권삼문이 1997년 『향토문화 제11·12 합집』에「울진의 고문서」라는 논문을 통해 해제. 발표하면서 세간에 처음 등장했다.
권삼문은 1988년 당시 입수한 복사본 수토절목의 해제를 담은 논문을 통해 ‘삼척 진영 사또와 월송만호가 삼 년에 한 번 씩 울릉도와 독도를 수토하기 위해 방문할 때 구산진(구산리)에서 출발하고 돌아오는데, 바람의 형편에 따라 대풍헌에서 머무는 기간이 길어지기도 하여 월송만호(무관, 종4품)가 구산진 등 9개의 연해촌락에 돈을 풀어 거기서 발생한 이식(利殖)으로 이 기간 동안의 경비를 조달케 했다’는 기록이 있음을 밝혔다.
또 완문(完文)은 진영 사또와 월송만호의 울릉 ‧ 독도 공무 시 필요한 비용, 구산진 등 연해 9개 동의 수행자 비용마련에 대한 분배 등을 담은 토의를 담고 있다.
이 논문을 통해 비로소 대풍헌이 조선조 당시 울릉 ‧ 독도를 실질 지배한 공무수행의 역사적 현장임이 확인된 셈이다.
당시 완문과 수토절목에 기록된 연해 9개 동은 표산동(기성 봉산1리), 봉수동(봉산2리), 송현동, 직고동(평해읍 직산리), 구암동(평해읍 거일리), 거일동, 포차동, 야음동, 구산동 등 아홉 마을이다.
최초 학계 보고자인 권삼문 여헌기념관 학예연구실장은 “완문의 경우, 1811년(신미년)으로, 수토절목의 작성연대는 1823년 계미년으로 추정된다.”고 하였다.
이후 일본정부의 독도 만행과 역사 왜곡이 자행될 때도 관련 학계는 대풍헌과 수토절목, 완문의 가치에 대해 주목하지 못하다가 “수토절목을 주목하라(남효선 기자 시민의 신문 2005년 3월)”는 제목의 기사가 보도되면서 관련 학계가 주목하기 시작했다.
대풍헌은 2005년 9월에, 수토절목은 2006년 6월에 각각 경북문화재 자료 493호와 511호로 지정됐다.
울진군은 경북도와 영남대학교독도연구소와 함께 지난 2013년부터 대풍헌과 구산항(구산포)을 중심으로 ‘수토사(搜討使) 뱃길 재현’과 학술대회를 열어 울진 구산항의 대풍헌과 최근 발굴된 월송포진의 역사성을 재조명하고 있다.
특히 울진군은 울릉 ‧ 독도의 실질지배현장을 역사관광자원화한다는 계획아래, 대풍헌과 월송포진 일대에 '수토문화나라' 조성사업을 통해 이곳을 국내 대표적인 '국토영유권 역사문화관광권'으로 조성한다는 야심찬 프로젝터를 추진하고 있다.

❙수토선
◆1823년 울진 대풍헌에서 무슨 일이...
우리나라 사서(史書)에 울릉도와 독도가 최초로 등장하는 것은 고구려 동천왕 20년인 246년도로 학계는 추정하고 있으며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고려사(高麗史) 지리지 동계(東界) 울진현조(蔚珍縣條)’이다. 이 기록 중 울릉도 및 독도와 울진과의 상관관계를 암시하는 기록은 “고려 원종 대에 울진현령 박순(朴淳)이 처자와 노비 및 가산을 배에 싣고 울릉(蔚陵)에 가려하였다”라는 기록이다.
실제 현재 울릉도와 동해안 일대와의 실제거리를 추적하면 강원도 임원항이 137㎞, 죽변항과의 거리는 140㎞로서 임원항이 죽변항 보다는 조금 더 가까우나 해류나 해풍의 경로, 고고학적 유적, 관련 설화 등으로 미루어 역사서에 등장하는 내륙의 출발지는 죽변진(竹邊津)이나 구산진(邱山津)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이 관련학계의 통설이다.
특히 조선시대 울릉 ‧ 독도지역의 수토(搜討)정책의 책임관이 월송만호였다는 점이 이같은 추정에 더욱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에 앞서 울릉도는 신라 지증왕 13년 이사부에 의해 징벌된 후 신라에 편입되었다. 당시 울진지방은 신라의 하슬라주에 속했으며 울릉도를 울진의 예하에 둔 것으로 학계는 추정한다.
한국 고대사의 전개과정에서 울진지방은 우중국(優中國) 또는 우유국(優由國)으로 불렸으며 당시 이 지역의 언어계통은 고구려나 부여계통과는 다른 특징이 있어, 문화상징체계의 차별성을 근거로 학계는 기원전 1세기
무렵부터 우중국이 설립된 3세기에 이르기까지 울진을 비롯한 동해안일대의 주민들이 울릉도로 이주한 것으로 추정한다.

❙ 월송포진 발굴현장

❙ 월송포진 발굴 항공사진
울진지역이 역사적 기록 속에 처음 등장하는 자료는 ‘삼국사기 지리조 명주(溟州) 울진군조’이다. 이 기록에 의하면 울진은 고구려의 우진야현(于珍也縣)에서 3세기 무렵에 신라에 편입된 후 신라 경덕왕대에 “울진”으로 개정된 것으로 확인된다.
울릉 ‧ 독도는 신라, 고려 두 왕조를 통해 왕래하면서 꾸준히 방물(토산물)을 헌납한 것으로도 확인된다. 이를 근거하는 것으로『고려사(高麗史)』에는 “고려 덕종대에 우릉성주(羽陵城主)가 아들을 시켜 토물을 헌납했다”는 것과 “고려 충목왕대에 동계의 우릉도 사람이 래조(來朝)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월송포진 유물과 유적지 유구
고려 우왕 7년인 1381년에 왜구가 울진·평해지방을 침략했다. 또 우왕 8년에 왜구가 평해군을 침략했다. 또 우왕 11년 1385년 6월에 왜구가 다시 평해군을 침범하자 강릉도도체찰사(江陵道都體察使) 목자안(睦子安)이 이를 격퇴했다.
조선조는 태종 3년 1403년도에 공도정책(空島政策 : 주민들이 섬을 도피처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비워두는 정책)을 실시하고 세조 12년인 1466년에 울진포와 월송포를 설치하였으며 강원도 울진현의 속도(屬島)로 편입했다.
이후 세종대에 울진인인 남호(南顥)가 울진 만호 겸 안무사의 책무를 받아 울릉도를 관할했다.
숙종 19년 1693년에는 “안용복 사건”이 발생한다. 이에 조선정부는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수토정책을 강화하고 삼척첨사(三陟僉使)와 월송만호를 정기적으로 파견해 관리했다.
당시 울릉도 수토를 위해 출발했던 곳이 현재 기성면 구산리에 소재한 대풍헌(待風軒)과 울진의 죽변진(현 죽변항)으로 확인된다.
◆수토 소요경비 9개 동민이 부담....수토 때 현지주민도 동행
이 같은 기록을 근거로 조선조 당시 울릉도와 독도는 강원도 울진군의 관할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또 수토를 위해 삼척 진영 영장과 평해 월송만호가 울릉도를 방문할 때 현지(당시 평해지역;현 울진군 평해읍) 주민들도 대거 왕래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권삼문은 “수토절목 등 대풍헌에 소장되어 있는 고문서는 울릉도와 독도의 영유권 문제는 물론 당시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소중한 사료”라고 덧붙였다.
대풍헌이 있는 구산마을은 울릉도와 독도 수토를 위해 바람을 기다리는(待風, 뱃길이 안전한 날을 기다리는) 대풍헌의 역사와 동해에 몸을 던져 충절을 지킨 고려조의 충신 백암(白巖) 김제(金濟)선생의 얼이 면면이 이어져 오는 곳이자 울진군의 주요 어장으로 이름나 있다.
.jpg)
월송정도_정선의 관동명승첩,1738년,간송장
◆ ‘월송포진’의 역사적 가치
무엇보다 눈여겨봐야할 대목이 지난 2012년 월송정 주변에서 발굴된 월송포진의 유적이다.
일찍이 울진 평해지방은 울릉 ‧ 독도 실질지배를 위한 뱃길의 첫출발지로 역사학계가 주목하고 있는 곳이다. 이른바 국토영유권의 역사적 현장인 셈이다. 그 대표적 문화유산이 기성면 구산리의 대풍헌(待風軒)과 이곳 월송포진과 월송정이다. 대풍헌은 조선조 울릉 ‧ 독도를 관할하기 위한 수토(搜討)를 위해 뱃길을 기다리던 출항지이다. 최근 월송숲 일원에서 월송포진의 유적이 발굴되면서 대풍헌과 함께 이곳 월송숲은 울릉 ‧ 독도 실질지배의 역사적 현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월송정은 지금의 모습 이전에 월송포진의 관문이었음이 확인되었다. 조선조 최고의 진경화가인 겸재 정선(謙齋 鄭敾, 1676~1759)의 '월송정'(越松亭)도 당시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울진군은 월송포진 일대를 국내 대표적인 '국토영유권 역사문화관광권'인 '수토문화나라'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해마다 봄철에 조선조 당시의 수토사 행렬을 재현하는 '수토사뱃길재현'축제를 펼치고 있다.
월송숲의 북쪽 언저리에 서 있는 '군무교비'(軍舞橋碑)도 눈길을 끈다. 군무교는 대풍헌이 있는 기성면 구산마을과 월송포진을 잇는 다리이다. 군무교비는 조선조 당시 구산마을과 월송을 잇는 교량건설의 전 과정을 담은 석비(石碑)이다. 특히 이 석비가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것은 당시 교량건설에 동원된 민중들의 이름과 역할이 고스란히 담겨있기 때문이다.

- 글쓴이 : 남효선
- 경북 울진에서 태어났다. 동국대학교 국문학과를 졸업했으며, 안동대학교 대학원에서 민속학을 공부하였다. 1989년 문학사상의 시 부문에서 신인상 수상으로 등단하였다. 한국작가회의, 경북작가회의, 안동참꽃문학회 등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시집으로 『둘게삼』이 있다. 현재 시민사회신문의 전국본부장으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