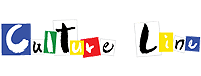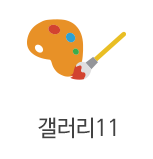문화포커스
- [정창식_마을이 있는 문경시]금포 백포
- 컬처라인(cultureline@naver.com)
금포 백포
정 창 식
모든 풍경은 상처다. 사람들은 자신만이 가진 사건과 그에게서 빚어낸 이미지, 즉 상처로 풍경을 바라본다. 소설가 김훈은 그의 산문집 ‘풍경과 상처’에서 모든 풍경은 상처일 수밖에 없다고 단정하였다.
그래서 같은 모습일지라도 각자가 빚어내는 풍경은 다를 수밖에 없다. 산을 보고 어떤 이는 푸르다 하고 또 누군가는 가고 싶다고 한다. 산을 색으로 표현하는 이들은 감상적(感傷的)이고, 산에서 치유를 경험한 사람들은 산을 오를 것이다.
그렇다면, 강은 어떤 상처를 지니고 있을까. 그리고 그 상처를 어떻게 보듬으면서 풍경을 만들어냈을까. 금포(金浦)와 백포(白浦)는 오랜 세월 켜켜이 쌓인 개별적인 상처들에 의해 숱한 풍경을 만들며 유유히 강과 함께 있다.
▪ 은빛 모래가 강물 같은 백포


백석과 백석정
금포와 백포는 눈으로만 보아서는 보이지 않는다. 눈을 감을 때 비로소 은빛 모래가 강물처럼 펼쳐지고 황토 빛 강물이 이어지는 옛 풍경이 살아난다. 푸른 하늘과 강물을 오가는 백로와 새들의 모습도 그려진다. 그러나 눈을 뜨면 마을과 강을 가로막는 높은 제방에 곧 좌절하게 된다.
“초등학교 때 금포마을 집 마루에서 발돋움 하면 모래와 강이 다 보였어요.”
어느 봄날, 천마산을 함께 등산하던 산악회의 여성회원이 하던 말이었다. 그에게 제방은 추억을 가로막는 상처다. 그래서 ‘풍경은 상처다’라는 김훈의 명제는 여기에서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
금포와 백포는 영순면 이목리에 있는 마을 이름이다. 큰 고개 왼쪽이 백포(白浦) 마을이고 오른쪽 마을이 금포(金浦)다. 백포에는 능성구씨들이 거주하고 금포에는 진주강씨들이 집성촌을 이루고 있다. 오랜 세월 서로 이웃하며 화목하게 지내오고 있다. 그러한 대표적인 상징이 백석정(白石亭)이다. 조선 전기 이조정랑을 지낸 백석 강제는 흰 괴석, 즉 백석(白石)이 바라보이는 달봉산 자락에 정자를 지어 그곳에서 학문을 벗하고 유유(悠悠)하며 자적(自適)하였다. 그리고 사위인 구선윤에게 정자를 물려주었다. 이곳을 ‘구씨정자’ 라고도 부르는 이유이다.
그때의 백석은 지금도 강변에 있다. 때론 물에 잠기어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때도 있지만, 지금은 흰 몸을 온전히 드러내고 있다. 17세기 우리지역의 유학자 부훤당 김해는 이곳을 찾아 ‘백석정십경운(白石亭十景韻)’이라는 시를 지었다.
‘강가의 불빛은 얼어붙은 추위를 녹이고
흰 달빛은 빈 하늘을 밝히네
깎아지른 절벽에 홀로 올라 멀리 바라보니
달밤에 더욱 아름다운 것을’
층암요월(層巖邀月)이라는 칠언절구의 시다. 하지만 그때의 풍경은 지금과 분명히 다르다. 정자 아래 양수장과 구조물 그리고 그가 읊었을 삼강주막 쪽 전경은 곧 설치될 다리와 관광지화 된 주막촌 때문에 낯설다. 그러나 백석정과 백석 그리고 강의 전경은 여전한 이곳의 풍경이다.
▪ 사라진 들꽃 포구 - 꽃개
백석을 뒤로 하고 제방을 따라 걷게 되면 모래사장이었을 강변이 유원지로 바뀌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 시내와 한참 멀리 있는 곳에 유원지가 있다는 사실에 당혹스럽다. 더구나 야구장까지. 그런 모습을 외면하며 눈길을 돌려 마을을 바라보면 마음이 고즈넉해진다. 달봉산을 뒤로 한 작은 포구마을 백포가 오후 볕을 받아 따뜻하다. 금포마을 쪽으로 걸어가면 꽃개, 즉 화개라고도 하고 화포(花浦)로도 불렸다는 곳에 이르게 된다. 꽃개는 강 건너 풍양면 하풍마을과 마주하던 포구의 옛 이름이다. 강 너머 풍양과 의성 사람들은 용궁 장날 이 포구를 이용했다고 한다. 낙동강에서 올라오는 소금배도 꽃개 나루에 배를 대었다고 한다. 그래서 꽃개는 이곳 포구마을의 중심이 된다. 그러나 들꽃이 만발했다는 꽃개는 지금 자취도 남아있지 않다. 이때의 풍경은 흔적도 없고 회복될 수 없는 상처임이 분명하다.
▪ 검고 신성한 바위가 있는 금포

달봉산에서 바라본 백포와 금포
강과 들을 번갈아보며 제방 위를 걷다보면 가을이 완연함을 알게 된다. 황금빛 들녘을 앞에 둔 마을이 금포다. 천마산이 마을을 품었다.
“옛날에는 팔십 가구가 살았는데 지금은 반도 안돼요. 산 아래 오붓한 마을이 보기
좋지요.”
젊은 날 객지에서 살다가 고향으로 되돌아왔다는 나이 지긋한 이의 말이다. 그의 말이 이어졌다.
“저 위에 안동댐이 생기면서부터 물이 적어졌어요. 이번 가뭄에는 더하고요.
물도 깨끗하지 않아요. 옛날에는 강에 들어가면 고기들이 다리에 감겼어요.”
그에게도 강은 상처가 되었다. 마른 내(川)가 된 현실의 저 강과 기억 속의 강은 서로 괴리되어 그에게 혼돈의 상흔(傷痕)으로 남았다. 마을 이름의 유래가 되는 검석을 찾아 보았다. 검석(黔石)은 검은 바위를 뜻한다. 마을의 상징석인 셈이다. 멀리 검은 바위가 보였다. 백포마을의 백석과 대비되는 검은 바위, 검석이다. 이곳의 이름이 금포인 까닭은 이 검석 때문이다. 금포는 '검은 바위가 있는 나루', 혹은 검은 것을 신령시한 옛 사람들이 ‘신성한 나루’라는 의미로 이름 지어진 것이다.
같은 공간에 백석과 검석이 마을의 상징이 된 것은 우연이기에는 흔치 않은 일이다. 흑과 백은 음양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색이다. 음양의 조화가 그렇듯이 두 마을이 서로 이웃하며 화목한 평화가 이어져왔음은 당연한 것이다. 결국 이곳에서는 모든 상처가 치유되어 왔다. 그래서 그 상처들은 저 큰 강을 따라 유유히 흘러가며 새로운 풍경을 만들어 왔다.
▪ 다시 금포 백포

언젠가부터, 이 두 마을의 파사드(facade), 즉 전경(全景)을 한 눈에 보고 싶었다. 아쉽게도 마을과 강을 가로막는 제방에서는 전경을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시야를 강 너머 저 옛 하풍나루에서 가져보기를 원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라보는 전경은 이러한 모습이기를 갈망하였다. 그것은 태고(太古) 때부터 있어왔던 마을의 원형질이 그 이름처럼 드러내어지는 상상이다.
백포마을의 집집마다 하얗게 칠해진 지붕 너머로 봄이 되면 하얀 청매화 꽃이 피고 금포마을에는 집집마다 파란색 지붕이 하늘에 닿고 그 사이로 붉은 홍매화가 산자락을 덮는 풍경이다. 기왕에 꽃개, 화포나루에는 이름처럼 들꽃이 사철 내내 만발했으면 좋다. 그것은 마을의 이름이 마을의 모습이 되는 상상이다.
그리스의 산토리니 마을처럼, 일본의 눈 덮인 시라가와 전통마을처럼 말이다. 그래서 옛적의 모습이 현실이 되는 풍경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이곳을 보여주고 싶다.
어린 소녀가 자신의 집 마당에서 발 돋음 하며 보았다던 옛 강의 풍경에서 그것은 가능할 수 있다. 마을과 강의 시야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떼어놓고 잊힌 꽃개에 꽃을 피워 어린 소녀의 눈을 다시 기쁘게 한다면 우리 모두도 기뻐할 수 있다. 그래서 금포와 백포가 산과 강 그리고 마을을 찾아오는 모두에게 사랑받고 위안을 줄 수 있는 마을이 되었으면 한다. 그때서야 풍경은 상처가 아닌 진정한 치유를 지닌 원형질의 풍경으로 다가온다.
어디 금포 백포만이랴. 우리가 눈 밝은 이의 맑은 가슴으로 우리 지역을 본다면야.

- 글쓴이 : 정창식
- ▪ 현 문경문화원 이사 ▪ 안동대학교 문화산업전문대학원에서 스토리텔링을 전공하였다. [주간문경]에 문경문화와 관련된 글을 연재하고 있다. 문경의 자연과 마을, 유적과 문화재 그리고 오래된 이야기들을 새롭게 봄으로써 문경문화의 가치를 높이고 싶어한다. ▪ 저서 수필집 "아름다운 선물 101" (2010) 에세이집 『아름다운 선물 101』 은 우리 인생에서 있어서 스치는 인연들과의 소중한 관계, 베풂의 마음 등 일상에서 느낀 감정들을 엮은 책이다. 수필집 "문경도처유상수" (2016) 주간문경에 2010년부터 연재하고 있는 문경문화와 관련된 글 중 57편을 선별해 책으로 엮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