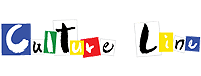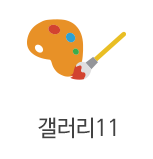문화포커스
- [김상현_영덕의 문화풍경]평민 의병장, 신돌석장군
- 김상현(cultureline@naver.com)
평민 의병장, 신돌석장군
김상현
호국의 고장 영덕,
전국 군단위로서 가장 많은 200여명의 독립유공자가 배출된 영덕,
평민의병장,
태백산 호랑이라 불리던 신돌석 장군이 태어난 곳.

<신돌석장군 영정>
영덕에서는 매년 호국의 달인 6월 13일 “장산 신돌석장군 숭모제향”이 거행된다. 행사는 제향행사와 추념식으로 진행되며, 지역의 군인, 학생과 군민들이 참여하여 장군의 호국정신을 기리고 계승하고 있다.


<숭모제향 행사>
신돌석장군은 1878년(고종 5년) 음력 11월 3일 영덕군 축산면 도곡리 (복디미) 에서 부친 신석주(申錫柱)와 모친 분성(盆城) 김씨 사이에 2남 2녀 중 첫째로 태어났다.
<신돌석장군 생가>
본관은 평산(平山)이며 본명은 태호(泰鎬)이며, 우리가 부르는 신돌석이란 이름은 어릴 때 불렀던 아명(兒名)이며, 태백산 호랑이라는 별명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장군은 영덕 영해지방의 향리, 중인 출신이라고 전해지고 있으나, 신장군이 태어난 마을이 대체로 신분이 높지 않은 사람들이 사는 작은 동네이며, 양반처럼 의관을 갖추다가 봉변을 당하는 일화로 볼 때 신돌석 장군이 갓을 쓰고 다닐만한 신분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신분에도 부친의 노력으로 13세 때 1년 정도 인근 마을의 서당에 다닐 수 있었는데, 축산면 상원 육이당(六怡堂) 이중립(李中立, 본관 眞城, 1860~1892)에서 기초적인 학문을 배웠다.
<육이당 전경>
<육이당 현판>
당시 이중립의 아들 이병국(李炳國)이 장군과 함께 수학하였는데 이 사실은 그의 『만사(挽詞)』에서 나타난다.
“한 동네 한 서당에서 친구로서 어릴 적부터 나의 부친이신 육이당의 서당에서 어른을 스승으로 함께 공부하였는데, 그의 체격이 세고 기질이 호탕하고, 활발하여 지도하기가 어렵게 보였으나 그의 마음이 명민하고 국량(局量)이 넓고 힘이 뛰어나니 스승께서 범상한 인물이 아니라 인정하고 같이 공부하게 하였으나 배움을 다하지 못하는 사이 아버지께서 별세함으로 다른 곳에서 공부할 곳이 없음을 슬퍼하여”
그 후 1896년 명성왕후 시해사건으로 전국에서 의병들이 일어나고 있을 무렵 장군 19세 때 영해에서 중장군이 되어 영덕 남천쑤 전투를 치렀다는 의병활동이 전해지며, 10년 후 을사늑약이 체결된 후인 1906년 4월 6일(음력 3.13) 그의 집에서 약 100m 떨어진 주점에서 200~300여명이 모여 영해를 중심으로 영릉의병진(寧陵義兵陣)을 창의하였는데, 영릉은 영해(寧海)와 강릉(江陵), 즉 동해안의 경북과 강원도 중심지역을 연결하는 넓은 지역에서 의병활동을 전개하겠다는 의지 표명인 것이다.
영릉의진은 당시 영천에서 조직된 산남의진(山南義陣)에서는 이를 ‘영해의진’ 혹은 ‘영해진’이라 불렀으며, 거병한 곳에서 바로 앞 상원마을 앞의 개천가 숲에서 훈련을 시작했고, 남쪽 맞은편에 우뚝 솟아 있는 고래산 중턱에서 군사훈련을 하였다. 또한 영릉의진의 편제는 해방직후에 작성된 『창의장명록(倡義將名錄)』에서 61명의 대표적인 인물과 그들이 맡았던 직책이 기록되어 있는데, 영릉의진의 구성원이 평민이나 하층민만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신돌석장군 보다도 신분이 높은 지역 문중 사람들도 함께 하고 있어, 사회적 신분의 변화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되고 있다.
<상원마을 앞 숲>
<상원마을이 보이는 고래산>
신돌석장군의 부대는 영덕과 청송, 영양, 영해 일대에서 전쟁에 필요한 사람, 무기, 식량을 확보하고 삼척, 울진지역의 일본군 전진기지를 집중 공격하는데 2년 6개월간 6차례나 공격을 감행하였다. 이러한 신돌석 장군의 동해안과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신출귀몰하며 일본군을 곤경에 빠뜨려 ‘태백산 호랑이’로 불렸다.
이렇게 평민의병장으로서 장군의 명성과 전과는 당시 유림 중심의 의병활동을 전국민의 항일의병 활동으로 확대 발전시켰으며, 장군은 1907년 음력 11월 경기도 양주에서 전국의 의병장들이 모여 13도창의군을 결성할 때 영남지방을 대표하는 교남창의대장(嶠南倡義大將)으로 추대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1908년 후반기부터 일본군이 계속 증원되고, 신식무기로 무장한 의병토벌대의 작전이 거듭되어 점차 의병활동이 위축되고 결국은 장군의 해산명령을 받은 의병들은 자진해산 혹은 투항하였으며, 장군은 만주로 건너가 새로운 항일투쟁을 계획하려 했으나 1908년 12월 12일(음11.19) 지품면 눌곡리에서 현상금을 탐낸 주민에 의해 살해되어 불과 30세의 짧은 나이로 순국하였다.
국가에서는 1962년 건국훈장 5등급 가운데 두 번째에 해당하는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하였으며, 신돌석장군의 묘소는 1971년 장군의 생가 마을 뒷산에서 국립현충원 애국자 묘역(131호)에 안장했다.
<신돌석장군 생가 뒷산>
<신돌석장군 묘소>
평민의병장 신돌석장군!
평민 출신으로 당시 지배 계급인 유림 사회에서 항일의병 지도자로 혁혁한 전과를 세웠으며, 전근대적인 계급사회에서 근대적 신분 사회로 변하는 역사적 발전을 증명하는 중요한 한국사의 인물이다.
1999년에 조성되어 된 신돌석장군 유적지를 간략하게 소개하면, 영덕군 축산면 신돌석장군길 224(도곡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신돌석장군 기념관, 충의사(사당), 동・서재가 배치하고 있다.

<신돌석장군 유적지 전경>
<신돌석장군 시비>
유적지 내에는 신장군께서 1906년(27세) 울진 평해 월송정(越松亭)에 올라 국망의 상황이 도래하자 애국충정을 감추지 못하면서 읊은 시비가 있다.
|
登樓遊子却行路 루에 오른 나그네 갈 길을 잊고 |
또한 1965년 영덕읍 우곡리 호호대 솔동산에서 이건한 순국의사 신돌석장군 기념비와 장군의 동생 태범이 각처에서 모금하여 건립한 의병대장신공유허비가 모셔져 있다.

- 글쓴이 : 김상현
- 현재 영덕군에서 문화관련 활동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