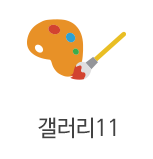문화포커스
- [황구하_시로 거니는 상주]상주문화역사의 지도 권태을 선생
- 황구하
“어이, 날세. 자네 지금 어디에 있는가?”
권태을 선생님 전화를 받으면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제 대답은 ‘사무실입니다’ 혹은 ‘밖에 있습니다’이지만 머릿속에선 몇 가지의 말씀이 겹쳐지곤 합니다. ‘공부는 어디에 있는가, 시(詩)는 어디에 있는가, 일은 또 어디에 있으며, 몸 아픈 건 아닌지 자네 스스로 돌보며 가고 있는가’라는 물음들이 그것입니다.
선생님을 처음 뵈었던 것은 어느 문학 강연에서였지요. 그러고 보니 벌써 십오륙 년이 되었습니다. 두 시간 남짓 되는 강의시간 내내 한 번도 쉬지 않고 참으로 고요하되 힘 있는 목소리였지요. 현실에 뿌리를 두는, 시대의 진실을 외면하지 않는 치열한 문학을 이야기하는 선생님은 제게 처음부터 후덕하고도 고고한 선비의 모습으로 각인되었습니다.
선생님을 만난 지 3, 4년쯤 지났을 때였지요. 감이 온통 노을빛으로 물든 시월 어느 날, 선생님 전화를 받고 부랴부랴 달려간 그곳엔 마침 선생님께서 재직하고 계시던 상주대학교 문학동아리 행사로 많은 사람들이 북적대고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불현듯 저에게 소주가 넘치도록 채워진 사발을 두 손으로 건네셨습니다.
“황 선생, 오늘은 이거 마셔야 합니다. 내가 사람 욕심이 좀 많아요. 고만 황 선생, 내 제자 합시다. 아름답잖아요. 그래야 이 무거운 말 좀 내려놓지 않겠노.”
참으로 얼떨결의 상황이었지만 가슴에 뜨겁게 번져오는 그것은 빈속에 들이부은 소주 탓만은 아니었습니다. 만남을 소중히 여겨 문외제자(門外弟子)로 삼아주신 과분한 사랑이다 싶어 고맙고 송구한 마음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께서 베풀어주시는 사랑은 따끔한 회초리와 당근이었습니다. ‘시 쓰는 놈이 이 좁은 데 갇혀서야 쓰겠느냐’ 하시다가도 ‘뜰이 작다고 꽃봉오리 작다더냐’ 하시고, ‘야야, 거기도 안 가보고 무슨 학문을 하노’ 하시곤 ‘다음엔 거기 한번 가세나’ 하시며 상주의 사람, 문화, 역사의 실타래를 하나하나 풀어주기 시작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저기 저거 무슨 바윈지 아나, 그 이름이나 기억해 놔라’ 하고 과제를 남기시곤 했지요.
세상은 그렇게 내 마음 끌리는 대로, 내가 보는 대로 존재하는 것인가 봅니다. 그러니 세상은 존재한다고 또 다 보이는 것도 아닌 것이지요.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상주에 살면서도 그저 이방인으로 동동 떠있던 저는 이 땅의 모든 것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발바닥이 간지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길 한 줄기, 돌멩이 하나에 깃든 숨결이 들려오면서 비로소 저는 이 세상과 손잡고 제 눈빛 하나에 파닥거리는 풍경을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상주에 살아야할 가치, 살아야만 하는 이유, 살고 싶은 뜨거움이 생긴 것이지요. 급기야 철학을 하겠노라고, 견딜 수 없는 이 갈증을 좀 풀어야겠다고, 그래서 시도 후련하게 써보고 싶다고 했을 때 선생님께서는 ‘척박한 땅에 물길을 낸다는 각오로 부디 남 다하는 거 하지 말고 묻혀 있는 걸 찾아 빛을 보게 해야 한다’시며 뒤늦은 대학원 공부에 묵직한 다짐을 얹어주기도 했습니다.
어느 해 여름, ‘소재 노수신의 심학(心學)’을 줄기로 석사논문을 준비하던 저는 몇몇 사람들과 어울려 선생님과 진도 답사 길에 올랐지요. 그것은 소재선생이 19년간이나 유배생활을 했던 그곳에서 현장의 숨결을 느끼고, 학계에 없는 연구 자료 때문에 애를 태우며 어떤 단초(端初)라도 잡고 싶어 하는 저를 위한 선생님의 배려였습니다. 더위에도 아랑곳없이 앞장서서 이끄시는 선생님 덕분에 얼마나 가슴 뭉클 했던 지요. 그때 마침 또 바다가 열리는 날이라서 그 감회는 남달랐습니다.
|
오래전 시 수업 받을 때
못난 사람 개똥철학이라도 좋다
할, 선생님 붉어진 눈시울 따라
어찌 여기 오리, 라고 생각이나 했겠는가
석양에 물든 선생님 말씀
|
누구라도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처음 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참으로 고되고 외롭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해놓으면 훗날 누군가는 좀 쉽게 그 길을 갈 수 있겠지요. 발자국이 길을 만들고, 그 작은 길들이 에돌아 마침내 산 하나를 훌쩍 넘는 것처럼, 누구라도 스스로 발자국을 떼지 않으면 길은 열리지 않는다는 걸 저는 그때 또 실감했지요. ‘다시 오기 힘든 곳을 밟았구나’ 하는 선생님 혼잣말에는 아무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
4월 11일 상주시 화서면 금산리 봉산서원에서 지역인사, 유림, 학자 등 약 300여명이 모인 가운데 ‘봉산서원 중건 고유제 및 소재 노수신 선생 학술발표회’가 열렸다. …… 이날 소재선생 사상과 관련, 황구하(영남대학교 철학과 박사과정)씨의 ‘소재 노수신의 심학’과 권태을(경북대 명예교수) 박사의 ‘소재 선생가의 가풍’을 주제로 학술발표가 있었다. 황씨는 “소재가 활동한 16세기에는 성리학이 확립된 시기였는데 유배지에서의 학문적 완숙으로 ‘숙흥야매잠해(夙興夜寐箴解)’, ‘인심도심변(人心道心辨)’, ‘집중설(執中說)’ 등을 지은 점, 학문적 성숙 후에 정치생활을 한 점이 첫 번째 특징”이라고 소개했다. 권 박사는 소재선생 형제들과 그 후손들을 대상으로 하여 혈통 및 개개인의 학덕과 사회적 기여도를 감안해 제현의 업적을 소개했으며 소재선생가의 가풍도 전했다.(매일신문. 2009. 4. 14) |

▲ 권태을 선생(봉산서원에서)
지난봄, 봉산서원에서 소재선생 학술발표회가 있었습니다. 그날 선생님께서는 스승과 제자가 나란히 발표를 하니 기분이 참 좋다하셨지요. 그러면서 논문 쓴 사람이 먼저라며 기어코 저를 앞세워 발표하게 하시고 선생님은 뒤로 한 걸음 물러나셨습니다. 어른들 앞이라 조심스럽고 떨리기도 했지만 그래도 의연하게 발표할 수 있었음은 선생님께서 든든하게 곁에 계셨기 때문이지요. 어찌 보면 선생님은 국문학박사로, 한문학자로 더 많은 활동을 하셨지만 저를 시인으로, 공부하는 사람으로 늘 북돋워주시기에 지금 여기 이만큼이라도 제가 있는 것이지요. 선생님은 그런 분입니다. 늘 조용히 뒷자리에 계시면서 사람은 물론이고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 바람, 하늘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의 가치를 발견하고 품게 하시는.


▲ 권태을 선생 저서(좌)와 공동저서(우) 중에서
상주의 문화, 역사관련 일을 하다보면 반드시 선생님을 건너야만 합니다. 어느 길을 가든, 어느 때에라도 반드시 선생님과 마주치게 됩니다. 선생님의 저서『식산 이만부 문학연구』,『상주한문학』,『상주한문학 연구』,『낙강범월시』,『청죽선생유고』등은 그 중에 가장 빛나는 이정표입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상주’관련 백화산, 공갈못, 경천대 등 상주곳곳의 문화와 역사 그리고 정경세, 이준, 노수신 등 수많은 인물과 맞닥뜨리면 지도를 펼치듯 먼저 선생님을 찾게 됩니다. 책을 들춰보거나 전화를 할 때마다 선생님께서는 한 번도 싫은 내색 없이 조분조분 길을 일러주시곤 하지요. 선생님께서 상주문화역사의 길을 얼마나 눈물겹게 일구어놓았는지 그때마다 절절하게 깨닫습니다. 특히 상주의 최초, 최고, 최대 등을 일목요연하게 뽑아놓은 어찌 보면 책이라고 할 수도 없는 아주 작은 별쇄본 『상주의 특장』은 제 가슴에 품고 있는 비서(秘書)이지요.
선생님께서 몇 년 전 1982년부터 23년간 재직하신 상주대학교에서 퇴임하면서 하신 강의를 저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식산선생을 공부하면서 저는 이제껏 식산선생처럼 살고 싶었습니다.” 선생님께서 박사학위논문으로 공부하셨던 식산(息山) 이만부(李萬敷, 1664~1732) 선생의 내용으로 학교강의를 마치시며 하신 그 말씀은 저 자신을 한없이 숙연하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식산선생이 그랬던 것처럼 선생님께서는 ‘학문의 자유, 학자의 양심이 얼마나 소중한가, 또 어떤 환경에서든 세상에 이로움을 내리고 교화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학자의 도(道)가 있음’을 실천으로 보여주고 계시면서도 ‘싶었습니다’라는 말씀으로 마지막까지 고개를 숙이고 계셨습니다. 자당(自黨)으로부터 ‘배를 가라앉힌다[沈舟]’는 위협을 받으면서도 자신의 주장을 펼쳐갔던 식산선생이 한 치도 학자적 양심에 어긋나는 일이 없었던 것처럼 선생님께서는 오늘도 ‘진실은 스승한테도 양보하지 못할 바가 있다’며 ‘부디 못된 사람이 되라’고 또 힘주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어찌할까요. 저는 이렇게 턱없이 못됨[不及]만 자꾸 불어나고 있으니.
|
“자네, 요즘 공부하기가 쉽질 않지? 공부로 치면 자네 외로운 거 다 안다. 죽을 맛이지. 둘을 화해시켜보게. 학문이든 문학이든 자기 빛깔과 자기 꼴을 지니기란 결코 쉽지 않. 그러나 그 둘은 하나이며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일 수밖에 없질 않겠나. 옛날 우리 선비들 생각을 해보게나. 학문과 문학과 삶이 언제 따로따로인 적이 있는가. 자네가 발 딛고 있는 지금 여기가 곧 중심일세. 자네 학문과 문학이, 아니 자네라는 사람이 앞으로 튼실하게 꽃을 피우면 좋겠네.” |
시도 학문도 구호에 그쳐 온전히 더 나아가지 못하는 제 근황을 선생님께서는 안타까이 훤히 보고 계셨을 테지요. 며칠 전 상주에 오신 선생님은 낮술을 두어 잔 받아 마셨다며 눈시울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선생님을 대구에 모셔다 드리고 오면서 가슴이 참 뻐근했는데 또 세상은 온통 밤안개로 휩싸여 길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스스로가 스스로의 길을 넓혀가는 것이지 결코 길이 스스로를 넓혀주지 않는다는 걸 요즘 절감합니다. 현실 삶을 반영하는 자기만의 ‘수행과 치유’, 그리고 ‘오만과 겸손’이 일가(一家)를 이뤄야 한다고 그날 낮은 목소리로 강조하신 것처럼 저는 선생님 제자로서 ‘불급(不及)’이 화두입니다. 때때로 자신을 벼리며 엄살떨지 말자고 스스로를 꾸짖지만 또 여전히 휘청휘청 흔들리면서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늘 기다립니다. ‘밥 먹자, 술 한 잔 치자, 얼굴 좀 보자’는 말씀의 딱 한 걸음 앞에 세워놓은, 선생님 그 위풍당당한 목소리.
“어이, 날세. 자네 지금 어디에 있는가?”(♣)

- 글쓴이 : 황구하
- 충남 금산에서 태어났다. 영남대학교 대학원 철학과(동양철학 전공)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2004년 『자유문학』으로 등단하였다. 시집 『물에 뜬 달』이 있으며 현재 반년간지 『시에티카』 편집국장으로 일하고 있다.